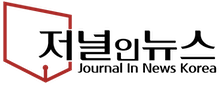칼럼Home > 칼럼
-
프랑스 연금 개혁안 반대 시위에 대한 단상
요즘 프랑스 파리는 연금 개혁안 때문에 2~3월 보통 난리가 아니다.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크롱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 법안이 성립 직전까지 왔다고 한다. 야당이 제출한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 불신임안은 모두 부결되었지만 정부가 하원 표결을 불신임하는 헌법 특별조항(49조 8항)을 발동하는 강경책까지 사용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풍파가 예상되고 있다. 당시 프랑스 하원에서 야당이 17일에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안은 의회를 통과하는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물론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내각이 총사퇴해야 했지만,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셈이다. 다만, 헌법위원회의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지만 법안의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할 권한이 있다해도 대체로 승인하는 편이기 때문에 연금개혁안 또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헌법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마린 르펜 등이 헌법위원회 검토를 요구 중에 엤다. 2022년 마크롱이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임명한 보른 총리는 하원 표결을 건너 뛰는 헌법 특별조항을 소환한 것이 것이 이번이 총 11번째의 일이다. 물론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정부가 의회를 건너 뛰고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전체 국민들의 지지와 야당의 지지까지 받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현재 여소야대 구도에서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혁을 지지한 우파 공화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당과 치열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향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의회가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게 되면 시간은 물론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여 원활한 국정 운영은 쉽지 않다. 이에 극좌 성향을 가진 마틸데 파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당" 의원은 정부를 붕괴시키고 개혁을 중단시키기 위해 단 9표가 부족했다. 프랑스인들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을 대변할 정부는 이미 죽었고 더는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올해 1월 10일에 발표한 한 이후인 지난 1월 19일부터 두 달 동안 8차례 전국적인 단위로 시위 및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된 20일에는 프랑스 각지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오면서 양상은 더욱 심각하게 변해갔다. 여기에 환경 미화 노동자들이 파업해 쓰레기가 거리에 쌓여 있으며 시위 때 쓰레기통에 불이 붙어 불 타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 노조는 23일에도 전국 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과잉 진압으로 현재 논란이 심화되는 중이다.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20일 표결이 끝난 뒤에도 시위가 잦아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프랑스 앞에 깊은 불확실성 시기가 놓여 있고 침묵을 지키는 마크롱 대통령이 어떻게 권위를 재확인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여론도 사실 좋지 않은 편이다. 여론 조사 기관인 엘라브가 18~19일 18살 이상 프랑스인 1,1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과반인 69%가 정부가 하원 투표를 건너 뛰고 법안 통과를 시도하는 것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개혁 법안 최종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가정할 때 정년은 2030년까지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늘어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2027년까지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64세에 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43년 동안 노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67세까지 일해야 한다. 노동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선이 최저 임금의 85%로 10% 올라간다. 다만, 취업을 일찍한 경우 조기퇴직이 가능하다. 워킹맘에게는 최대 5% 연금 보너스가 지급되는 절충안을 만들었지만 그게 현실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
프랑스 절대왕정의 신분체제이자 유럽 중근세 시대의 봉건제를 대표하는 이름, 앙시엥 레짐(Ancien Régime) 이야기
앙시엥 레짐(Ancien Régime)은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기 이전의 프랑스 왕국의 국가 체제를 통칭하는 단어로 나타난다. 앙시엥 레짐(Ancien Régime)은 프랑스어로 ‘옛 체제’를 뜻하고 있다. 그러나 앙시앵 레짐을 단순히 중세 유럽에 유행했던 봉건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은 오랫동안 봉건제 아래에서 왕권과 귀족권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그러한 대립의 결과가 관습법과 성문법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형성되어진 사회구조를 통칭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1789년 혁명을 거치면서 앙시앵 레짐의 모든 것을 부정하였으며 의회 중심의 국가로 재편되면서 민주주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왕정복고(The Restoration)'가 이루어지고 대혁명 당시에 이루어졌던 '제도 개선(System improvement)'은 점차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는 당시 부르주아에서 신흥귀족으로 변모한 자들이 프랑스에서 돈과 권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고 이와 같이 축적된 힘이 혁명을 무위로 돌아가게 했던 이유가 됐다. 앙시엥 레짐을 신분제도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왕과 왕의 가족 아래에 크게 3개의 신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왕을 정점으로 하는 이 신분제는 내부를 들여다 보면 신분끼리 완전히 이해관계가 일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서 크게 알려진 것은 특권층 신분과 피지배층 신분의 갈등이라는 구도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다. 앙시앵 레짐의 특권층이 전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특권층들부터가 분열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 프랑스 내에서도 특권 폐지 외에 귀족과 성직자 계급의 전면적인 숙청에는 반대하는 주장들이 상당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자코뱅 당이 몰락한 이유가 이러한 부분인데 정작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 1758~1794) 본인은 이런 숙청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다수의 특권층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일례로 20세기 프랑스 공화국의 과학자로 알려진 루이 드 브로이(Louis de Broglie, 1892~1987)는 공작 작위를 갖고 있었으며 특권만 없었을 뿐이지 재산도 매우 많았고, 귀족 작위 및 칭호도 허가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이러한 특권 폐지 외에 귀족과 성직자 계급의 전면적인 숙청에는 반대하는 자들은 주로 내세울 것이 없는 하급 귀족이나 시골 혹은 소도시 성당의 하위 성직자들이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평민 취급을 받아 특권을 가질 만한 것이 없었던 데다 갈수록 상층부가 견고해지면서 오히려 특권이 없어지는 것이 쉽게 출세를 하는 발판인 상황이 되다 보니 대체로 혁명에 협조적이었다. 후일 프랑스 황제가 되는 나폴레옹은 지중해 코르시카 섬의 이탈리아계 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을 바탕으로 한 절대왕정은 루이 14세 때 전성기를 누렸으나, 루이 15세, 루이 16세를 거치면서 점점 허울만 남은 상태로 변해갔다. 근본적으로는 재정 악화로 인해 프랑스 왕가의 절대적인 세력이 약화된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루이 16세가 즉위하기도 전에 프랑스의 절반에 해당되는 지역의 징세권은 세리들에게 넘어가 있었고 왕권은 상당부분 약화된 상태였다. 이에 대한 일례로 태양왕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귀족들을 순화하는 장소'로 사용했지만, 루이 16세 시대에는 오히려 '귀족들이 권력을 논하는 장소'로 변화했으며, 루이 14세가 사망하자마자 그의 사법권을 충실히 집행했던 파리 고등법원과 기타 여러 지방 법원들은 다시 귀족들의 세력 하에 들어왔다. 1789년 혁명 전야 때는 절대왕정 자체가 이미 이름 뿐인 개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루이 16세 또한 나라를 변혁할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부르봉 왕조가 루이 16세를 중심으로 단합하지 못하고, 왕가의 주요 인물들이 서로 간의 권력과 부의 욕심으로 인해 분열해 있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프랑스 왕실의 힘이 더욱 약화되었다. 혁명 이후, 왕정이 복고되었을 때 루이 18세와 샤를 10세는 은근히 절대왕정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었으며, 루이 13세의 자손으로 왕가의 인척인 오를레앙 공은 이전부터 왕위를 노리고 왕가의 권위를 낮추는 반(反) 왕실 활동을 후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을 지원하여 왕정을 전복시키는데 크게 일조했다. 이런 부르봉 가문과 오를레앙 가문의 대립은 무려 프랑스 제3공화국 수립에도 도움을 주었을 정도로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이어지면서 프랑스 상류층의 대표적인 라이벌로 자리잡게 되었다. 앙시엥 레짐의 제1계층은 성직자와 수도자 계층으로 약 13만 명에 달했다. 대체로 프랑스 국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카톨릭이라는 종교적 특성상 교황의 신하라는 이중적인 면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교황이 중세 시대와는 달리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프랑스 국왕의 신하나 다름 없었다. 이러한 제1계층의 숫자는 당시 프랑스 전 국민의 0.8%~1% 미만에 불과했지만 경작 가능 토지의 10%를 차지하고 있었고, 교회의 십일조와 수도원의 토지까지 합쳐서 여러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면세 계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단한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제1계층 모두가 기득권층은 아니었고 일선에 있는 성직자들과 고위 성직자, 그리고 고위 성직자 중에서도 상황에 따라 재물 축적 및 정계 및 군대에 진출함에 따라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도 했다. 물론 고위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하위 성직자 및 수도자들끼리도 계층이 갈려 대주교와 주교, 수도원장이나 수녀원장과 같은 고위급 성직자 및 수도자들은 귀족 가문에서 주로 충당되었고, 주요 직위들도 귀족 출신이 독점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프랑스 내의 큰 성당들과 수도원이 귀족 출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혜택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위 성직자들은 귀족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지방의 작은 본당이나 시골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당시에 농민 및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현실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고 있었고, 신분도 귀족과 먼 계층들이 많았다. 따라서 교회의 자금도 일괄적으로 거두어가서 재분배하는 형태였는데, 최소 단위 교구나 본당에는 자금이 내려오지 않은 데다 내려오더라도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접촉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위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고위 성직자 및 수도자들과 철저히 이해관계가 달랐다. 실제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였지만, 이 당시에는 프랑스 교회가 교황이 있는 로마 교회에 완전히 종속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갈리아 교회주의가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프랑스에서 이단심문은 자주 나타나는 행사가 아니었으며 교황이 내린 결정 사항도 우선적으로 프랑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적용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종교적 통제를 지지한 루이 14세는 어디까지나 프랑스 교회를 자신이 더 통제하기를 원했을 뿐, 프랑스 카톨릭의 분립을 원하지 않았다. 실제로 프랑스는 로마 이단 심문관의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독자적인 종교재판소를 소유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교황도 가장 강력하면서 신앙심이 깊은 카톨릭교도의 국왕들은 필수적으로 가까이 해야만 하는 강력한 동맹이었기 때문에 이는 암묵적으로 유지되기도 했다. 이전에는 스페인 국왕이 가장 강력하면서 신앙심이 깊은 카톨릭 군주로서 교황을 지켜주는 우방의 역할을 했지만 루이 14세의 집권 이후 프랑스가 스페인을 뛰어넘어 유럽의 최강국이 되면서 스페인 국왕이 하던 역할을 프랑스 국왕이 대신 하게 되었다. 심지어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루이 14세의 둘째 손자였던 필리프가 스페인의 왕이 되었고 필리프의 아들들은 스페인 뿐만 아니라 교황령 남부의 시칠리아 왕국과 나폴리 왕국의 왕까지 되었기 때문에 교황은 더더욱 프랑스의 왕을 멀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갈리아 교회주의는 종교에 관심 없던 나폴레옹이 집권하게 되면서 대부분 붕괴되었다.
-
Generation Z: Navigating a New World
Previous generations reveled in tales of their student years, reliving love stories that didn't go as planned, laughing about regrettable tattoos, and reminiscing about late-night adventures that defined their youth. But what will Generation Z, born into a world of unprecedented challenges and rapid technological change, remember from these formal years. Stephen Bartlett, a 31-year-old British entrepreneur and podcaster, shares a poignant reflection on his Gen Z experience. His student years were overshadowed by the coronavirus pandemic, which confined him to his room, turned university meals into solitary events, and transformed short walks into the highlight of his social life. For many in Generation Z, crucial milestones such as their student years and the brief window of carefree living before entering the workforce were marked by isolation and disruption. One might assume that these hardships forged a generation of hyper-resilient individuals ready to tackle the world's challenges. However, Bartlett argues that this isn't necessarily the case. In a recent article in The Economist, Generation Z is described as the “least resilient” generation. Bartlett echoes this sentiment, noting that he and his peers are often viewed as sensitive, socially awkward, and prone to hiding behind screens. Critics suggest that frequent job changes, absenteeism, and mental health issues are now common among Gen Z, attributing these trends to a deeper malaise. The Struggles and Criticisms of Gen Z Bartlett paints a somber picture of his generation, describing how many struggle to integrate into the adult world. The intense focus on academic success often leaves them ill-prepared for real-world problem-solving and critical thinking. The emphasis on university education saddles many with debt for degrees that may not align with their career paths, discouraging risk-taking and unconventional career choices. Moreover, Bartlett points out that Gen Z is often uncomfortable with discomfort. Raised in a culture that tends to invalidate differing viewpoints, many lack exposure to healthy dialogue, which is essential for developing resilience and the ability to respectfully disagree. Moreover, Bartlett points out that Gen Z is often uncomfortable with discomfort. Raised in a culture that tends to invalidate differing viewpoints, many lack exposure to healthy dialogue, which is essential for developing resilience and the ability to respectfully disagree. The heightened focus on mental health, while important, can sometimes create a sense of fragility. Bartlett acknowledges that mental health awareness is crucial, but he warns that the constant analysis of emotions can lead to an overwhelming sense of vulnerability. The perpetual engagement with social media exacerbates this issue, fostering a desire for instant gratification and eroding attention spans. This constant digital presence has real-world implications. For instance, job applications have become gamified, which can diminish the seriousness with which they are approached. This shift affects work culture, reducing the ability to persist through challenging tasks or endure less satisfying roles. Adapting to Modern Challenges The result, Bartlett argues, is a generation unaccustomed to discomfort, lacking perseverance, and unprepared for life's inevitable challenges. Adding to this is an ongoing anti-establishment sentiment that portrays society as fundamentally flawed and oppressive. Social media and around-the-clock influencers distort perceptions of reality, exacerbating these feelings. Fifty years ago, generational divides were defined by differences in culture, music, and fashion. Today, technology and a paradoxical overload of information have deepened these divides, altering how we live, think, and interact. In this landscape, truth has become subjective, and independent thought seems restricted. Society appears more divided and uncivilized, with individuals increasingly distant from one another, avoiding meaningful interactions. Yet, there is hope. If Generation Z can cultivate the resilience and determination necessary for modern life, they may navigate these challenges successfully. Embracing discomfort, fostering critical thinking, and learning to engage constructively with differing viewpoints will be crucial. By doing so, perhaps we can ensure that the next generation will have a brighter, more connected future to look forward to, with stories of resilience and triumph to tell.
-
Mystery of the Pyramids Unveiled: The Hidden River of the Sahara
The Enigma of the Pyramids' Location Discovery of the Lost River The Role of the Ahramat River Unearthing the Past The River's Disappearance A New Chapter in Egyptology
-
조지아가 주목한 트란스니스트리아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정식 국명으로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이다. 이 뜻은 드네스트르 강 건너의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로 불린다. 이 국가는 동유럽에 있는 미승인국으로 1991년부터 사실상 독립 상태에 있으며 독립국가임을 자칭하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특수군사작전을 감행하면서 몰도바 역시 국내 사정이 우크라이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있다. 특히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안보 회의 중 몰도바를 침공하려는 계획이 담긴 듯한 지도를 공개하여 논란이 커졌다. 따라서 몰도바의 대통령 마이아 산두는 몰도바를 루마니아에 병합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면서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위기를 겪게 된다. 몰도바와 루마니아는 사실상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9세기 초반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속국이었던 몰다비아 공국의 동쪽 절반이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으로 할양되면서 서로 다른 나라가 된 것으로 보인다. 몰도바를 루마니아에 병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여 위기감이 고조된 것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근처인 드네스트르 강 동쪽에 사는 러시아-슬라브계 주민들이었다. 특히 몰도바인들도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은 러시아어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동참했다. 2021년의 대선에서는 현 대통령인 바딤 크라스노셀스키(Вадим Красносельский)와 다른 무소속 후보인 세르게이 핀자르(Сергей Пынзарь) 후보 단 두 후보만 나섰다.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35.3%의 낮은 투표율이 나왔으나 25%는 넘기면서 유효한 대선으로 인정이 되었다. 현 대통령인 크라스노셀스키 대통령이 75%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하며 2선에 성공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세가 불안정한 국가인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는 입장을 표명하는데 반해 국방부는 러시아에 대해 과도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이 러시아의 계획과 달리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자 러시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 국방부로 하여금 가짜 깃발 작전을 벌여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주둔한 러시아군을 동원하기도 했다. 현재 트란스니스트리아에는 약 1,500명의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자치의회는 지난 28일 특별회의를 열고 22만 명의 러시아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몰도바의 점증하는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합병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월 몰도바 정부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과의 거래에 관세를 도입하며 경제적 압박을 가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중에 트란스니스트리아와의 국경을 봉쇄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이 지역으로 가는 송유관도 막았다. 이에 따라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사실상 몰도바 뿐이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가 교역품에 과세하면 트란스니스트리아 GDP의 10%에 이르는 비용이 더 생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러시아와 합병론이 부상하자 가장 긴장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조지아다. 조지아는 압하지야 자치공화국과 남오세티아 자치공화국이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 또한 러시아계 주민이 80% 이상 되는 미승인 자치공화국이며 러시아와 이미 두 차례 남오세티아 전쟁을 벌인 바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러시아와 합병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압하지야와 남오세이타에 미칠 것이며이 자치공화국들 또한 러시아와 합병론을 주장하게 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조지아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에 대한 영유권과 영토주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돈바스처럼 러시아에 합병되기라도 한다면 조지아의 영토는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터키와 러시아의 압박을 받아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놓이기 때문이다. 최근 조지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예의주시하며 보고 있다. 그만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 더욱 그러하다.
-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가 분리된 이유 (下편)
코소보 전쟁 이후, 유고슬라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정권이 실각하면서 주카노비치는 세르비아와의 분리독립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세르비아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마르크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주카노비치는 이 때부터 집단 서방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 주카노비치는 독일에게 내주면 안 될 것을 내주게 된다. 이는 몬테네그로의 확실한 수입원인 관광 산업이었다. 헤르체그 노비, 코토르, 티바트, 부드바와 같은 아드리아 해안가의 도시들은 예로부터 휴양도시로 유명했다. 실제로 사회주의 시기부터 여름 휴양지로 유명했었는데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었던 요시프 티토의 휴양지도 몬테네그로에 존재했을 정도였다. 워낙 몬테네그로의 경제력이 처참했던 탓에 독일의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국가 경제를 유지하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베오그라드 연방 정부에 새로운 지원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기에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두 개의 연방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몬테네그로는 경제적인 독립화를 선언했다. 이 때 독일과 프랑스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몬테네그로에 유입되었고 두 국가의 검은 돈, 탈세의 창구로 이용되기 시작한다. 현재 유럽에서 몰타와 키프로스가 갖고 있었던 탈세 창구의 위치를 90년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 몬테네그로가 갖고 있었던 셈이다. 연방 내 경제적 독립에 성공한 주카노비치는 이내 정치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계획하게 된다. 특히 독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몬테네그로 사회민주당(Социјалдемократска партија Црне Горе)은 주카노비치가 당수로 활동하면서 해안가 4개 도시인 헤르체그 노비, 코토르, 티바트, 부드바의 개혁파들을 중심으로 독일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으며 몬테네그로 정국을 주도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 보이슬라브 코슈투니차(Војислав Коштуница)는 연방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몬테네그로의 정치적 독립을 반대했다. 그러나 독일과 집단 서방, 미국은 주카노비치와 몬테네그로 사민당을 적극 지지하며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구성된 신(新)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할하기에 나선다. 한편 신 유고 연방은 밀로셰비치가 물러나게 되면서 몬테네그로 독립에 대해 세르비아 사회는 오히려 반대하는 모양새에 들어갔고, 잘못하면 몬테네그로 국민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리자 사민당은 독일 및,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독립을 잠시 유보하고 세르비아 공화국과 타협해 세르비아와 국가 연합을 구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베오그라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3년에 유고슬라비아는 헌법을 개정하였고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 연합'으로 국호를 바꾸게 된다. 당시 부총리에 재직했던 자르코 라크체비치(Жарко Ракчевић)는 세르비아와 연합을 반대했던 인물이지만 베오그라드 협정이 체결되자 스스로 부총리 직위를 사임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외교적 노선은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세르비아는 친러 성향으로 친러를 고수하고 몬테네그로는 친서방주의를 고수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독일의 지원을 받은 몬테네그로는 코소보 전쟁에서 파괴된 세르비아보다 경제력에서 훨씬 우월한 상태였고 세르비아는 전후복구를 몬테네그로가 받은 서방의 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몬테네그로 내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하기 직전까지 몰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내 정정마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몬테네그로는 독일 및집단 서방과의 협상을 통해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독립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결정하게 된다. 대신 집단 서방은 주카노비치에게 최소 찬성의 55%는 넘겨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고 마침내 2006년 5월 21일에 헌법에 따라 몬테네그로에서는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시행되었다. 이 투표에서 몬테네그로는 55.5%의 찬성을 얻었고 결국 미국과 집단 서방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마침내 몬테네그로는 세르비아와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헌법은 무효화 되었으며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고 주카노비치의 총리 지위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에 대해 세르비아 내에서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약속한 대로 세르비아에서도 몬테네그로의 독립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자치공화국으로서의 헌법을 독립국 헌법으로 개정하여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이로써 유고슬라비아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신(新) 유고슬라비아가 해체 된 것은 사실상 그 배경에는 집단 서방이 있었고 독일이 그 배후에 있었다. 게다가 신 유고 연방 내 악화된 경제 상황은 두 나라의 분리로 이어졌다. 주카노비치는 헬무트 콜-게르하르트 슈뢰더-앙겔라 메르켈로 이어지는 독일 정계와 친분을 유지했고 몬테네그로 독립에 최종적으로 싸인한 인물 또한 당시 신임 총리였던 메르켈이었다. 결국 유고슬라비아를 분할해서 쪼개는데 성공한 집단 서방은 2008년 코소보도 분할하는데 성공하여 세르비아는 국가 생존마저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맞이한다. 그러나 세르비아의 배경에는 여전히 러시아가 있었고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세르비아는 진작에서 멸망하고 남았을 국가였다.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는 상호 간에 주권국가로 갈라서게 되었지만 그 외에 모든 부분은 상호 협력하고 있다.
-
-
프랑스 연금 개혁안 반대 시위에 대한 단상
- 요즘 프랑스 파리는 연금 개혁안 때문에 2~3월 보통 난리가 아니다.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크롱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 법안이 성립 직전까지 왔다고 한다. 야당이 제출한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 불신임안은 모두 부결되었지만 정부가 하원 표결을 불신임하는 헌법 특별조항(49조 8항)을 발동하는 강경책까지 사용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풍파가 예상되고 있다. 당시 프랑스 하원에서 야당이 17일에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안은 의회를 통과하는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물론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내각이 총사퇴해야 했지만,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셈이다. 다만, 헌법위원회의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지만 법안의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할 권한이 있다해도 대체로 승인하는 편이기 때문에 연금개혁안 또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헌법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마린 르펜 등이 헌법위원회 검토를 요구 중에 엤다. 2022년 마크롱이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임명한 보른 총리는 하원 표결을 건너 뛰는 헌법 특별조항을 소환한 것이 것이 이번이 총 11번째의 일이다. 물론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정부가 의회를 건너 뛰고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전체 국민들의 지지와 야당의 지지까지 받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현재 여소야대 구도에서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혁을 지지한 우파 공화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당과 치열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향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의회가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게 되면 시간은 물론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여 원활한 국정 운영은 쉽지 않다. 이에 극좌 성향을 가진 마틸데 파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당" 의원은 정부를 붕괴시키고 개혁을 중단시키기 위해 단 9표가 부족했다. 프랑스인들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을 대변할 정부는 이미 죽었고 더는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올해 1월 10일에 발표한 한 이후인 지난 1월 19일부터 두 달 동안 8차례 전국적인 단위로 시위 및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된 20일에는 프랑스 각지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오면서 양상은 더욱 심각하게 변해갔다. 여기에 환경 미화 노동자들이 파업해 쓰레기가 거리에 쌓여 있으며 시위 때 쓰레기통에 불이 붙어 불 타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 노조는 23일에도 전국 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과잉 진압으로 현재 논란이 심화되는 중이다.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20일 표결이 끝난 뒤에도 시위가 잦아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프랑스 앞에 깊은 불확실성 시기가 놓여 있고 침묵을 지키는 마크롱 대통령이 어떻게 권위를 재확인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여론도 사실 좋지 않은 편이다. 여론 조사 기관인 엘라브가 18~19일 18살 이상 프랑스인 1,1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과반인 69%가 정부가 하원 투표를 건너 뛰고 법안 통과를 시도하는 것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개혁 법안 최종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가정할 때 정년은 2030년까지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늘어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2027년까지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64세에 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43년 동안 노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67세까지 일해야 한다. 노동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선이 최저 임금의 85%로 10% 올라간다. 다만, 취업을 일찍한 경우 조기퇴직이 가능하다. 워킹맘에게는 최대 5% 연금 보너스가 지급되는 절충안을 만들었지만 그게 현실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
- 칼럼
- Nova Topos
-
프랑스 연금 개혁안 반대 시위에 대한 단상
-
-
프랑스 절대왕정의 신분체제이자 유럽 중근세 시대의 봉건제를 대표하는 이름, 앙시엥 레짐(Ancien Régime) 이야기
- 앙시엥 레짐(Ancien Régime)은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기 이전의 프랑스 왕국의 국가 체제를 통칭하는 단어로 나타난다. 앙시엥 레짐(Ancien Régime)은 프랑스어로 ‘옛 체제’를 뜻하고 있다. 그러나 앙시앵 레짐을 단순히 중세 유럽에 유행했던 봉건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은 오랫동안 봉건제 아래에서 왕권과 귀족권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그러한 대립의 결과가 관습법과 성문법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형성되어진 사회구조를 통칭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1789년 혁명을 거치면서 앙시앵 레짐의 모든 것을 부정하였으며 의회 중심의 국가로 재편되면서 민주주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왕정복고(The Restoration)'가 이루어지고 대혁명 당시에 이루어졌던 '제도 개선(System improvement)'은 점차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는 당시 부르주아에서 신흥귀족으로 변모한 자들이 프랑스에서 돈과 권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고 이와 같이 축적된 힘이 혁명을 무위로 돌아가게 했던 이유가 됐다. 앙시엥 레짐을 신분제도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왕과 왕의 가족 아래에 크게 3개의 신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왕을 정점으로 하는 이 신분제는 내부를 들여다 보면 신분끼리 완전히 이해관계가 일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서 크게 알려진 것은 특권층 신분과 피지배층 신분의 갈등이라는 구도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다. 앙시앵 레짐의 특권층이 전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특권층들부터가 분열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 프랑스 내에서도 특권 폐지 외에 귀족과 성직자 계급의 전면적인 숙청에는 반대하는 주장들이 상당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자코뱅 당이 몰락한 이유가 이러한 부분인데 정작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 1758~1794) 본인은 이런 숙청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다수의 특권층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일례로 20세기 프랑스 공화국의 과학자로 알려진 루이 드 브로이(Louis de Broglie, 1892~1987)는 공작 작위를 갖고 있었으며 특권만 없었을 뿐이지 재산도 매우 많았고, 귀족 작위 및 칭호도 허가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이러한 특권 폐지 외에 귀족과 성직자 계급의 전면적인 숙청에는 반대하는 자들은 주로 내세울 것이 없는 하급 귀족이나 시골 혹은 소도시 성당의 하위 성직자들이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평민 취급을 받아 특권을 가질 만한 것이 없었던 데다 갈수록 상층부가 견고해지면서 오히려 특권이 없어지는 것이 쉽게 출세를 하는 발판인 상황이 되다 보니 대체로 혁명에 협조적이었다. 후일 프랑스 황제가 되는 나폴레옹은 지중해 코르시카 섬의 이탈리아계 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을 바탕으로 한 절대왕정은 루이 14세 때 전성기를 누렸으나, 루이 15세, 루이 16세를 거치면서 점점 허울만 남은 상태로 변해갔다. 근본적으로는 재정 악화로 인해 프랑스 왕가의 절대적인 세력이 약화된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루이 16세가 즉위하기도 전에 프랑스의 절반에 해당되는 지역의 징세권은 세리들에게 넘어가 있었고 왕권은 상당부분 약화된 상태였다. 이에 대한 일례로 태양왕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귀족들을 순화하는 장소'로 사용했지만, 루이 16세 시대에는 오히려 '귀족들이 권력을 논하는 장소'로 변화했으며, 루이 14세가 사망하자마자 그의 사법권을 충실히 집행했던 파리 고등법원과 기타 여러 지방 법원들은 다시 귀족들의 세력 하에 들어왔다. 1789년 혁명 전야 때는 절대왕정 자체가 이미 이름 뿐인 개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루이 16세 또한 나라를 변혁할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부르봉 왕조가 루이 16세를 중심으로 단합하지 못하고, 왕가의 주요 인물들이 서로 간의 권력과 부의 욕심으로 인해 분열해 있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프랑스 왕실의 힘이 더욱 약화되었다. 혁명 이후, 왕정이 복고되었을 때 루이 18세와 샤를 10세는 은근히 절대왕정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었으며, 루이 13세의 자손으로 왕가의 인척인 오를레앙 공은 이전부터 왕위를 노리고 왕가의 권위를 낮추는 반(反) 왕실 활동을 후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을 지원하여 왕정을 전복시키는데 크게 일조했다. 이런 부르봉 가문과 오를레앙 가문의 대립은 무려 프랑스 제3공화국 수립에도 도움을 주었을 정도로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이어지면서 프랑스 상류층의 대표적인 라이벌로 자리잡게 되었다. 앙시엥 레짐의 제1계층은 성직자와 수도자 계층으로 약 13만 명에 달했다. 대체로 프랑스 국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카톨릭이라는 종교적 특성상 교황의 신하라는 이중적인 면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교황이 중세 시대와는 달리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프랑스 국왕의 신하나 다름 없었다. 이러한 제1계층의 숫자는 당시 프랑스 전 국민의 0.8%~1% 미만에 불과했지만 경작 가능 토지의 10%를 차지하고 있었고, 교회의 십일조와 수도원의 토지까지 합쳐서 여러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면세 계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단한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제1계층 모두가 기득권층은 아니었고 일선에 있는 성직자들과 고위 성직자, 그리고 고위 성직자 중에서도 상황에 따라 재물 축적 및 정계 및 군대에 진출함에 따라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도 했다. 물론 고위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하위 성직자 및 수도자들끼리도 계층이 갈려 대주교와 주교, 수도원장이나 수녀원장과 같은 고위급 성직자 및 수도자들은 귀족 가문에서 주로 충당되었고, 주요 직위들도 귀족 출신이 독점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프랑스 내의 큰 성당들과 수도원이 귀족 출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혜택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위 성직자들은 귀족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지방의 작은 본당이나 시골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당시에 농민 및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현실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고 있었고, 신분도 귀족과 먼 계층들이 많았다. 따라서 교회의 자금도 일괄적으로 거두어가서 재분배하는 형태였는데, 최소 단위 교구나 본당에는 자금이 내려오지 않은 데다 내려오더라도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접촉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위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고위 성직자 및 수도자들과 철저히 이해관계가 달랐다. 실제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였지만, 이 당시에는 프랑스 교회가 교황이 있는 로마 교회에 완전히 종속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갈리아 교회주의가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프랑스에서 이단심문은 자주 나타나는 행사가 아니었으며 교황이 내린 결정 사항도 우선적으로 프랑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적용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종교적 통제를 지지한 루이 14세는 어디까지나 프랑스 교회를 자신이 더 통제하기를 원했을 뿐, 프랑스 카톨릭의 분립을 원하지 않았다. 실제로 프랑스는 로마 이단 심문관의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독자적인 종교재판소를 소유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교황도 가장 강력하면서 신앙심이 깊은 카톨릭교도의 국왕들은 필수적으로 가까이 해야만 하는 강력한 동맹이었기 때문에 이는 암묵적으로 유지되기도 했다. 이전에는 스페인 국왕이 가장 강력하면서 신앙심이 깊은 카톨릭 군주로서 교황을 지켜주는 우방의 역할을 했지만 루이 14세의 집권 이후 프랑스가 스페인을 뛰어넘어 유럽의 최강국이 되면서 스페인 국왕이 하던 역할을 프랑스 국왕이 대신 하게 되었다. 심지어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루이 14세의 둘째 손자였던 필리프가 스페인의 왕이 되었고 필리프의 아들들은 스페인 뿐만 아니라 교황령 남부의 시칠리아 왕국과 나폴리 왕국의 왕까지 되었기 때문에 교황은 더더욱 프랑스의 왕을 멀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갈리아 교회주의는 종교에 관심 없던 나폴레옹이 집권하게 되면서 대부분 붕괴되었다.
-
- 칼럼
- Nova Topos
-
프랑스 절대왕정의 신분체제이자 유럽 중근세 시대의 봉건제를 대표하는 이름, 앙시엥 레짐(Ancien Régime) 이야기
-
-
Generation Z: Navigating a New World
- Previous generations reveled in tales of their student years, reliving love stories that didn't go as planned, laughing about regrettable tattoos, and reminiscing about late-night adventures that defined their youth. But what will Generation Z, born into a world of unprecedented challenges and rapid technological change, remember from these formal years. Stephen Bartlett, a 31-year-old British entrepreneur and podcaster, shares a poignant reflection on his Gen Z experience. His student years were overshadowed by the coronavirus pandemic, which confined him to his room, turned university meals into solitary events, and transformed short walks into the highlight of his social life. For many in Generation Z, crucial milestones such as their student years and the brief window of carefree living before entering the workforce were marked by isolation and disruption. One might assume that these hardships forged a generation of hyper-resilient individuals ready to tackle the world's challenges. However, Bartlett argues that this isn't necessarily the case. In a recent article in The Economist, Generation Z is described as the “least resilient” generation. Bartlett echoes this sentiment, noting that he and his peers are often viewed as sensitive, socially awkward, and prone to hiding behind screens. Critics suggest that frequent job changes, absenteeism, and mental health issues are now common among Gen Z, attributing these trends to a deeper malaise. The Struggles and Criticisms of Gen Z Bartlett paints a somber picture of his generation, describing how many struggle to integrate into the adult world. The intense focus on academic success often leaves them ill-prepared for real-world problem-solving and critical thinking. The emphasis on university education saddles many with debt for degrees that may not align with their career paths, discouraging risk-taking and unconventional career choices. Moreover, Bartlett points out that Gen Z is often uncomfortable with discomfort. Raised in a culture that tends to invalidate differing viewpoints, many lack exposure to healthy dialogue, which is essential for developing resilience and the ability to respectfully disagree. Moreover, Bartlett points out that Gen Z is often uncomfortable with discomfort. Raised in a culture that tends to invalidate differing viewpoints, many lack exposure to healthy dialogue, which is essential for developing resilience and the ability to respectfully disagree. The heightened focus on mental health, while important, can sometimes create a sense of fragility. Bartlett acknowledges that mental health awareness is crucial, but he warns that the constant analysis of emotions can lead to an overwhelming sense of vulnerability. The perpetual engagement with social media exacerbates this issue, fostering a desire for instant gratification and eroding attention spans. This constant digital presence has real-world implications. For instance, job applications have become gamified, which can diminish the seriousness with which they are approached. This shift affects work culture, reducing the ability to persist through challenging tasks or endure less satisfying roles. Adapting to Modern Challenges The result, Bartlett argues, is a generation unaccustomed to discomfort, lacking perseverance, and unprepared for life's inevitable challenges. Adding to this is an ongoing anti-establishment sentiment that portrays society as fundamentally flawed and oppressive. Social media and around-the-clock influencers distort perceptions of reality, exacerbating these feelings. Fifty years ago, generational divides were defined by differences in culture, music, and fashion. Today, technology and a paradoxical overload of information have deepened these divides, altering how we live, think, and interact. In this landscape, truth has become subjective, and independent thought seems restricted. Society appears more divided and uncivilized, with individuals increasingly distant from one another, avoiding meaningful interactions. Yet, there is hope. If Generation Z can cultivate the resilience and determination necessary for modern life, they may navigate these challenges successfully. Embracing discomfort, fostering critical thinking, and learning to engage constructively with differing viewpoints will be crucial. By doing so, perhaps we can ensure that the next generation will have a brighter, more connected future to look forward to, with stories of resilience and triumph to tell.
-
- 칼럼
- Thoughts Of Seraphine
-
Generation Z: Navigating a New World
-
-
Mystery of the Pyramids Unveiled: The Hidden River of the Sahara
- The Enigma of the Pyramids' Location Discovery of the Lost River The Role of the Ahramat River Unearthing the Past The River's Disappearance A New Chapter in Egyptology
-
- 칼럼
- Thoughts Of Seraphine
-
Mystery of the Pyramids Unveiled: The Hidden River of the Sahara
-
-
조지아가 주목한 트란스니스트리아
-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정식 국명으로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이다. 이 뜻은 드네스트르 강 건너의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로 불린다. 이 국가는 동유럽에 있는 미승인국으로 1991년부터 사실상 독립 상태에 있으며 독립국가임을 자칭하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특수군사작전을 감행하면서 몰도바 역시 국내 사정이 우크라이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있다. 특히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안보 회의 중 몰도바를 침공하려는 계획이 담긴 듯한 지도를 공개하여 논란이 커졌다. 따라서 몰도바의 대통령 마이아 산두는 몰도바를 루마니아에 병합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면서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위기를 겪게 된다. 몰도바와 루마니아는 사실상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9세기 초반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속국이었던 몰다비아 공국의 동쪽 절반이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으로 할양되면서 서로 다른 나라가 된 것으로 보인다. 몰도바를 루마니아에 병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여 위기감이 고조된 것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근처인 드네스트르 강 동쪽에 사는 러시아-슬라브계 주민들이었다. 특히 몰도바인들도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은 러시아어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동참했다. 2021년의 대선에서는 현 대통령인 바딤 크라스노셀스키(Вадим Красносельский)와 다른 무소속 후보인 세르게이 핀자르(Сергей Пынзарь) 후보 단 두 후보만 나섰다.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35.3%의 낮은 투표율이 나왔으나 25%는 넘기면서 유효한 대선으로 인정이 되었다. 현 대통령인 크라스노셀스키 대통령이 75%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하며 2선에 성공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세가 불안정한 국가인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는 입장을 표명하는데 반해 국방부는 러시아에 대해 과도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이 러시아의 계획과 달리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자 러시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 국방부로 하여금 가짜 깃발 작전을 벌여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주둔한 러시아군을 동원하기도 했다. 현재 트란스니스트리아에는 약 1,500명의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자치의회는 지난 28일 특별회의를 열고 22만 명의 러시아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몰도바의 점증하는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합병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월 몰도바 정부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과의 거래에 관세를 도입하며 경제적 압박을 가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중에 트란스니스트리아와의 국경을 봉쇄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이 지역으로 가는 송유관도 막았다. 이에 따라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사실상 몰도바 뿐이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가 교역품에 과세하면 트란스니스트리아 GDP의 10%에 이르는 비용이 더 생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러시아와 합병론이 부상하자 가장 긴장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조지아다. 조지아는 압하지야 자치공화국과 남오세티아 자치공화국이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 또한 러시아계 주민이 80% 이상 되는 미승인 자치공화국이며 러시아와 이미 두 차례 남오세티아 전쟁을 벌인 바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러시아와 합병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압하지야와 남오세이타에 미칠 것이며이 자치공화국들 또한 러시아와 합병론을 주장하게 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조지아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에 대한 영유권과 영토주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돈바스처럼 러시아에 합병되기라도 한다면 조지아의 영토는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터키와 러시아의 압박을 받아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놓이기 때문이다. 최근 조지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예의주시하며 보고 있다. 그만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 더욱 그러하다.
-
- 칼럼
- Nova Topos
-
조지아가 주목한 트란스니스트리아
-
-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가 분리된 이유 (下편)
- 코소보 전쟁 이후, 유고슬라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정권이 실각하면서 주카노비치는 세르비아와의 분리독립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세르비아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마르크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주카노비치는 이 때부터 집단 서방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 주카노비치는 독일에게 내주면 안 될 것을 내주게 된다. 이는 몬테네그로의 확실한 수입원인 관광 산업이었다. 헤르체그 노비, 코토르, 티바트, 부드바와 같은 아드리아 해안가의 도시들은 예로부터 휴양도시로 유명했다. 실제로 사회주의 시기부터 여름 휴양지로 유명했었는데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었던 요시프 티토의 휴양지도 몬테네그로에 존재했을 정도였다. 워낙 몬테네그로의 경제력이 처참했던 탓에 독일의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국가 경제를 유지하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베오그라드 연방 정부에 새로운 지원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기에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두 개의 연방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몬테네그로는 경제적인 독립화를 선언했다. 이 때 독일과 프랑스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몬테네그로에 유입되었고 두 국가의 검은 돈, 탈세의 창구로 이용되기 시작한다. 현재 유럽에서 몰타와 키프로스가 갖고 있었던 탈세 창구의 위치를 90년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 몬테네그로가 갖고 있었던 셈이다. 연방 내 경제적 독립에 성공한 주카노비치는 이내 정치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계획하게 된다. 특히 독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몬테네그로 사회민주당(Социјалдемократска партија Црне Горе)은 주카노비치가 당수로 활동하면서 해안가 4개 도시인 헤르체그 노비, 코토르, 티바트, 부드바의 개혁파들을 중심으로 독일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으며 몬테네그로 정국을 주도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 보이슬라브 코슈투니차(Војислав Коштуница)는 연방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몬테네그로의 정치적 독립을 반대했다. 그러나 독일과 집단 서방, 미국은 주카노비치와 몬테네그로 사민당을 적극 지지하며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구성된 신(新)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할하기에 나선다. 한편 신 유고 연방은 밀로셰비치가 물러나게 되면서 몬테네그로 독립에 대해 세르비아 사회는 오히려 반대하는 모양새에 들어갔고, 잘못하면 몬테네그로 국민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리자 사민당은 독일 및,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독립을 잠시 유보하고 세르비아 공화국과 타협해 세르비아와 국가 연합을 구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베오그라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3년에 유고슬라비아는 헌법을 개정하였고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 연합'으로 국호를 바꾸게 된다. 당시 부총리에 재직했던 자르코 라크체비치(Жарко Ракчевић)는 세르비아와 연합을 반대했던 인물이지만 베오그라드 협정이 체결되자 스스로 부총리 직위를 사임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외교적 노선은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세르비아는 친러 성향으로 친러를 고수하고 몬테네그로는 친서방주의를 고수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독일의 지원을 받은 몬테네그로는 코소보 전쟁에서 파괴된 세르비아보다 경제력에서 훨씬 우월한 상태였고 세르비아는 전후복구를 몬테네그로가 받은 서방의 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몬테네그로 내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하기 직전까지 몰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내 정정마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몬테네그로는 독일 및집단 서방과의 협상을 통해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독립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결정하게 된다. 대신 집단 서방은 주카노비치에게 최소 찬성의 55%는 넘겨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고 마침내 2006년 5월 21일에 헌법에 따라 몬테네그로에서는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시행되었다. 이 투표에서 몬테네그로는 55.5%의 찬성을 얻었고 결국 미국과 집단 서방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마침내 몬테네그로는 세르비아와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헌법은 무효화 되었으며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고 주카노비치의 총리 지위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에 대해 세르비아 내에서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약속한 대로 세르비아에서도 몬테네그로의 독립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자치공화국으로서의 헌법을 독립국 헌법으로 개정하여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이로써 유고슬라비아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신(新) 유고슬라비아가 해체 된 것은 사실상 그 배경에는 집단 서방이 있었고 독일이 그 배후에 있었다. 게다가 신 유고 연방 내 악화된 경제 상황은 두 나라의 분리로 이어졌다. 주카노비치는 헬무트 콜-게르하르트 슈뢰더-앙겔라 메르켈로 이어지는 독일 정계와 친분을 유지했고 몬테네그로 독립에 최종적으로 싸인한 인물 또한 당시 신임 총리였던 메르켈이었다. 결국 유고슬라비아를 분할해서 쪼개는데 성공한 집단 서방은 2008년 코소보도 분할하는데 성공하여 세르비아는 국가 생존마저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맞이한다. 그러나 세르비아의 배경에는 여전히 러시아가 있었고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세르비아는 진작에서 멸망하고 남았을 국가였다.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는 상호 간에 주권국가로 갈라서게 되었지만 그 외에 모든 부분은 상호 협력하고 있다.
-
- 칼럼
- Nova Topos
-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가 분리된 이유 (下편)
실시간 칼럼 기사
-
-
최근 크로아티아의 우스타샤 후예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Za Dom, spremni!(조국을 위해 준비하라!)" 크로아티아의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ć) 총리는 지난 크로아티아 총선에서 승리했고 여당인 크로아티아 민주연합(Hrvatska Demokratska Zajednica)이 이기긴 했지만 여전히 조란 밀라노비치 대통령이 이끄는 크로아티아 사회민주당(Socijaldemokratska partija Hrvatske)의 세가 강하다. 게다가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정치적인 실권은 없지만 친러시아 성격을 갖고 있어 러시아와의 외교를 강화하고 중국 기업을 끌어들여 일대일로 아드리아 해 사업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세르비아와 화해 구도를 열어가기 위해 접촉 중인데 곧 세르비아를 방문할 시진핑 주석이 오는 시기에 맞춰 무언가를 진행중인듯 싶다. 아직 그게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바는 없다. 이에 크로아티아 극우세력들은 적극적으로 반발하여 자그레브 내에서 연일 시위를 열고 있다. 이에 세르비아의 부치치 대통령은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을 우스타샤의 후예라고 비난 했고 플렌코비치 총리를 "파벨리치의 아들(Потомци Павелића)"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에 자그레브에서는 "Za Dom, spremni! (조국을 위해 준비하라!)"는 우스타샤의 표어를 앞세워 반러, 반중, 반세르비아 정서를 강화하고 있는 입장이다. 우스타샤는 크로아티아의 반 유고슬라비아 분리주의 운동 조직이면서 철저히 극우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탈리아 파시즘의 영향을 받았고 여기에 크로아티아의 국교나 마찬가지인 카톨릭이 섞인, 종교 전체주의(Religious Totalitarianism)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들은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의 영향이 강했다. 베니토 무솔리니도 "고대 로마제국의 영향을 살리겠다(Faremo rivivere la gloria dell'antico Impero Romano)"는 극우주의적 표어로 선전, 선동하여 당선되었고 이는 "Za Dom, spremni! (조국을 위해 준비하라!)" 표어 제작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사실상 우스타샤는 무솔리니의 자금지원까지 받아서 활동했었다. 특히 우스타샤의 창설자인 안테 파벨리치(Ante Pavelić, 1889~1959)는 무솔리니를 매우 존경했다. 그는 크로아티아의 독립과 보스니아 및 달마티아의 병합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정당 프랑코프치(Frankopci)에 입당했는데 당은 요시프 프랑크(Josip Frank)가 지도하고 있었다. 요시프 프랑크(Josip Frank)는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사상가 주세페 보타이(Giuseppe Bottai)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인물이다. 주세페 보타이(Giuseppe Bottai)는 "이탈리아 식민 제국에서의 이탈리아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Comprendere il ruolo degli italiani nell'impero coloniale italiano)"라는 제목에서 “Illuminano il mondo con la loro arte, insegnano con la loro conoscenza e forniscono una forte organizzazione nazionale nel nuovo territorio attraverso le loro capacità e abilità di governo (그들의 예술로 세상을 밝히고, 그들의 지식으로 가르치며, 그들의 통치 기술과 능력을 통해 새 영토에 튼튼한 국가 조직을 마련할 것)”이라 주장했었다. 이것을 스파치오 비탈레(Spazio Vitale)라고 한다. 요시프 프랑크(Josip Frank)는 여기에 박수치고 있었던 인물이고 안테 파벨리치(Ante Pavelić)는 이를 크로아티아의 실정에 맞게 시도하고자 했던 인물인 것이다. 프랑크가 정부에 의해 체포되자 파벨리치는 프랑크 밑에서 개인 비서 역할을 했고 1927년 자그레브 시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 국왕의 독재가 강화되면서 그는 무장단테 조직인 우스타샤(Ustaša)를 탄생시킨다. 우스타샤(Ustaša)라는 이름은 '서다', '오르다'라는 뜻의 단어인 'Ustati', Bставать (일어서다)의 슬라브어인 Usta, 중세 이탈리아어인 Scalatia (오르다의 중세어)를 합성해 만든 단어다. 이는 이후 크로아티아에서 "반란(Pobuna)"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당연히 이들은 나치식 경례를 채용했는데 경례구호는 "Za Dom, spremni! (조국을 위해 준비하라!)", 우스타샤의 표어였다. 이같은 구호는 나치 독일의 'Sieg Heil'에 상응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크로아티아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붕괴되면서 독립한 세력에 가깝다. 본래 남슬라브 민족의 통합을 원하고 있던 세르비아와 협력해 크로아티아인의 독립을 공고히 하기를 원했었다. 그러나 세르비아인은 크로아티아인들로 인해 자신들의 정치적 위치가 위협당할까봐 두려워했고 크로아티아인들은 세르비아를 중심으로 남슬라브의 체제가 돌아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파벨리치는 유고슬라비아 왕국 내부에서 크로아티아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반란을 주도했으며 결국 크로아티아에서 추방되어 이탈리아 왕국으로 조직을 옮겼다. 역시 이들은 이탈리아와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다. 나치 독일의 영향을 받은 것은 그 이후의 얘기다. 한편 같은 시기, 크로아티아에서는 알렉산데르 1세가 유고슬라비아 왕국을 선포하고 1931년 9월 3일 신헌법을 반포했다. 그러나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유고슬라비아 내의 경제마저 파탄에 이르자 1932년 들어 민주주의로 복귀하라는 시위가 빗발치게 되고 파벨리치는 이를 이용해 알렉산데르 1세에 대한 암살을 계획한다. 이 때 알렉산데르 1세는 프랑스와 회담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1934년 프랑스 마르세유를 방문한다. 프랑스 외무장관이자 총리를 역임했던 장 루이 바르투(Jean Louis Barthou)과 회담을 진행했다. 한편 파벨리치는 불가리아의 IMRO (내부 마케도니아 혁명 기구)와 손을 잡고 알렉산데르 1세의 암살을 의뢰하게 된다. 이 때 의뢰를 받은 인물이 블라도 체르노젬스키(Владо Черноземски, 1897~1934)이다. 체르노젬스키는 회담장에 뛰어들어 알렉산데르 1세에게 한 발, 장 루이 바르투에게도 한 발의 권총을 발사했고 알렉산데르 1세는 그 자리에 심장이 관통되어 절명했다. 한편 장 루이 바르투는 국왕을 지키려다 팔에 총알이 관통했고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바르투의 경우, 빨리 지혈했으면 살 수 있었지만 동맥에 총을 맞은데다 그걸 버티기 힘들 정도의 고령의 나이였기에 병원에 옮겨진 지 1시간 뒤에 사망했던 것이다. IMRO (내부 마케도니아 혁명 기구)의 해제된 기밀문서에 의하면 당시 체르노젬스키가 의뢰를 받은 것은 알렉산데르 1세 한 명이었다고 한다. 즉, 바르투가 죽은 것은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다. 이 파장은 엄청났다. 유고슬라비아는 우스타샤의 소행임으로 밝혀내고 파벨리치의 소환을 이탈리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이를 거부하고 그를 잠시 형무소에 가두는 걸로만 마무리했으며 그 마저도 3개월만에 풀려났다. 사실상 무솔리니가 풀어준거나 다름없는데 이후 그와 우스타샤는 독일로 넘어가 히틀러를 만나게 된다. 그는 히틀러에게 크로아티아를 위해 유태인, 집시, 세르비아인, 공산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숙청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나치 독일의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이 발생하면서 유고슬라비아가 점령되자 파벨리치는 자신의 조직 우스타샤를 이끌고 크로아티아로 돌아와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왕국, 헝가리 왕국의 지원으로 괴뢰 정부 크로아티아 독립국(Nezavisna Država Hrvatska, 약칭 NDH)을 세우게 된다. 이 나라는 이탈리아 왕국의 보호령이기도 하였지만 사실상 나치와 파시즘이 교합된 괴뢰국이었고 이탈리아 왕국 사보이 왕조 방계인 사보이아오스타(Duca d'Aosta) 가문의 아이모네를 국왕 토미슬라브 2세(Tomislav II, 1900~1948)로 즉위시켰다. 그러나 실권은 우스타샤와 그 지도자 파벨리치가 쥐고 있었다. 그러나 토미슬라브 2세는 명목상 크로아티아의 왕이었지만 정작 크로아티아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크로아티아 왕위 자체는 일단 수락하였으나, 본인이 크로아티아의 왕으로 즉위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고 이탈리아의 달마티아 병합의 현실성에 관한 개인적인 의문과 안전 보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크로아티아로 가는 것은 거부하였다고 한다. 어차피 이름 뿐인 왕인데 굳이 파벨리치가 자행한 숙청의 피바람을 지켜봐야 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파벨리치는 크로아티아 독립국의 실질적인 수장이나 마찬가지였다. 파벨리치는 우스타샤들과 함께 세르비아가 주도하는 유고슬라비아에서 민족적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나치 독일과 협력하여 세르비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우스타샤는 '1/3론'이라는 정책을 세웠는데 크로아티아에 있는 세르비아계의 1/3은 살해하고 1/3은 카톨릭으로 개종시키고 1/3은 추방한다는 뜻이었다. 그 결과 세르비아인 25만 명을 국외로 추방하고 40만여 명의 세르비아인과 10만 이상의 유태인을 학살했다. 그리고 20만 명이 강제로 가톨릭으로 개종당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했다. 이들은 같은 슬라브계인 세르비아를 학살하면서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절대적으로 협력했다. 이러한 나치 추종 세력 중 가장 악질적인 집단이 우크라이나의 스테판 반데라 집단과 크로아티아의 우스타샤 집단으로 꼽히고 있는 이유다. 학살에서 살아남은 대다수 크로아티아의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학살과 탄압을 피해 크로아티아의 고향을 버리고 세르비아로 피난을 가기도 했지만 살던 터전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크로아티아인이나 가톨릭교도인 척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우스타샤는 세르비아인들을 총살은 물론이고 산 채로 태워 죽이기도 했다. 심지어 우스타샤 신병에게 팔 다리를 묶은 세르비아인 또는 유태인들의 배를 갈라 죽이게 하는 시험을 보게 했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사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심지어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는 잔혹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같은 만행은 당시 발칸반도에 주둔하던 나치 독일군들조차도 그 잔혹함에 놀랐을 정도였다. 자그레브에 위치한 독일 점령군 사령부는 그들의 잔혹함을 차마 보지 못하고 오히려 히틀러에게 우스타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의 행위에 독일군과 이탈리아 군이 우스타샤의 무장을 해제한 다음에야 학살의 만행이 끝났다고 전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세르비아인들은 인종청소를 당하다가 나치 독일이나 파시즘의 이탈리아가 인종 절멸에서 구해준 셈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파벨리치는 1941년 4월 30일 국적법을 개정하여 아예 비 크로아티아 시민을 무국적자로 만들어버렸다. 이 날 민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도 만들면서 철저하게 세르비아인들을 솎아냈다. 6월 4일에는 크로아티아의 사회, 청년, 스포츠, 문화조직, 문학 및 언론, 예술에 비 아리아인의 참가가 금지되었고 자발적 아리아인이 된 크로아티아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1941년 6월 15일 크로아티아 독립국은 삼국 동맹 조약에 가입하였으며 6월 26일에는 방공 협정에 가입하였다. 12월 14일에 파벨리치는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를 한다. 1942년 9월에 파벨리치는 독일을 방문하여 히틀러의 허가를 얻은 후 크로아티아의 제2인자이며 원수인 슬라브코 크바텔니크(Slavko Kvatelnik)를 공식 해임한 이후 정부 재편을 실시했다. 더불어 1943년에 형식상의 국왕이었던 토미슬라브 2세가 퇴위했기 때문에 그는 명실상부한 1인 독재자가 되었다. 이후 그와 우스타샤는 아인자츠그루펜이나 SS를 상대로 어떻게 하면 총 한 번 쏘지 않고 편리하고 쉽게 살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수업을 열었고 나치 친위대원들이 이를 배워가기까지 했으며 여기에서 배운 아인자츠그루펜은 우크라이나로 건너가 스테판 반데라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Організація Украінських Націоналістів)인 일명 OUN에게 전수하기도 했다. 우스타샤는 민병대들을 이용하여 1941년부터 1945년까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22만~50만 명의 세르비아인들을 학살했는데 심지어 당시 카톨릭계는 이들을 변호하기까지 했다. 반면 크로아티아인은 나치 독일이 이들을 고트족의 후예라 하며 선동했기 때문에 학살을 면할 수 있었고 도리어 대다수의 크로아티아인들이 나치에 협력하였다. 사실 역사적으로 따지면 남슬라브인들 중, 세르비아인이면 모를까 크로아티아인은 고트족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한편 홀로코스트 수용소 중에도 야세노바츠 강제수용소를 필두로 한 노동수용소까지 포함하면 크로아티아 독립국 영내에 세워져 있던 것이 30곳이나 되었다. 물론 세르비아인들도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민병대 체트니치가 조직되었고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이 게릴라 전을 벌이며 나치 독일군과 이탈리아군, 우스타샤 민병대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결국 민병대들은 1945년 1월, 크로아티아 독립국 군대에 흡수되었지만 이미 전세는 연합군 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의 세력은 더욱 강해졌다. 결국 무솔리니가 실각됨으로서 이탈리아군이 모든 점령지에서 철수했고 1944년 헝가리가 자국 보호를 위해 철군했다. 결국 독일군까지 물러나자 우스타샤는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에게 궤멸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파벨리치는 해외로 도피하여 스페인 및 아르헨티나, 칠레 등 여러 나라로 몸을 숨겼고 해방된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 인민재판에서 궐석으로 사형 판결이 내려졌으며 망명 중이던 1957년 아르헨티나에서 티토 정부에서 보낸 암살자의 총탄에 맞았는데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1959년 스페인에서 총상 후유증으로 병원에 누워 있다가 죽었다. 현재 크로아티아의 네오나치들이나 민족주의자들은 서로 우스타샤의 후신임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이들이 유고슬라비아에서부터의 민족적 독립을 위해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일 우스타샤는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전쟁 때 프라뇨 투지만 크로아티아 초대 대통령에 의해 복원된다. 학살 대상은 세르비아 인뿐만 아니라 보슈냐크 무슬림까지 대상으로 삼았다. 1995년 데이턴 협정에 따라 투지만이 서구권으로부터의 비난 여론을 감수한 끝에 우스타샤를 해산했지만 그 뿌리는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의 민족주의적 이념으로 인한 세르비아인 학살은 반 크로아티아 감정을 세르비아 인들에게 남기기 충분했고 현재도 세르비아의 체트니치와 더불어 서로를 증오하는 양대산맥으로 남아있다.
-
- 칼럼
- Nova Topos
-
최근 크로아티아의 우스타샤 후예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
실증 사학의 문제와 그 한계
- 흔히 사학이라고 하면 우리는 실증사학을 떠올리기 마련이고, 실증사학을 맨 먼저 주장했던 근대사학의 대부격인 독일의 사학자인 레오폴드 폰 랑케(1795-1886)를 거론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랑케는 역사가의 서술 원칙을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가가 바로 원전 사료에 충실해서 사실을 주관적 관점의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이때 역사가는 원전 사료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과거의 역사가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해야만 하고, 비판적 작업을 통해 순수한 역사적 사실을 철저하게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랑케에게 역사가의 임무는 원전 사료에 기초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랑케의 방법론으로 과연 있는 그대로의 과거가 재현될 수 있는가? 사실 불가능하다. 물론 원전 사료를 통해 역사가가 신화 혹은 구전이 아닌 역사적 사실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의 사실을 그 자체로 재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 원전 사료에 대한 역사가의 비판적 작업이란 근본적으로 역사가 각자의 역사관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오류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역사가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언제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필자는 매우 오래전에 역사 문제로 논쟁을 했던 적이 있었다. 한 사람은 실증사학에 몰두하면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려는 관점을 견지했고, 다른 한 사람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 그 자체보다는 해석을 중시했다. 그러나 둘 다 이론적 기초가 너무도 미흡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대체로 전자의 경우에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문제고, 후자의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이 자의적 해석에만 의존할 경우 역사의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지가 문제다. 실증사학의 문제는 역사가가 역사를 과거사로만 돌리면서 현재의 역사를 망각해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살아 있는 역사가 아니라, 박제화가 된 죽은 역사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와 반대로, 역사적 사실을 해석에만 치중할 경우는 어떤가? 보통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역사가라기보다는 문헌학자인 경우가 많다. 그는 문헌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니까 역사적 원전 사료도 마찬가지인데, 역사적 사실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보다 해석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서, 최소한의 역사적 사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그는 원전 사료에 대한 의미나 해설 정도로만 원전 사료를 이해하는 수준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또 역사학이 다른 분야, 예를 들어 인류학, 고고학 등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간과된다. 필자는 두 사람 각각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사실 필자의 관점에서는 둘 다 모두 서로 보충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주장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각자의 논거는 불충분했다. 이때 문뜩 필자는 학부 시절 사학을 배우면서 느꼈던 일들이 떠올랐다. 사실 필자는 당시에 학과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 까닭은 현실과 아무런 관계도 의미도 없는 박물관의 유물과 같은 역사가 왜 필요한가에 관해 아무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에 필자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역사에 대한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역사철학의 문제라고 하겠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역사철학이라고 할 때, 역사가들은 강한 거부감을 갖는다. 그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곤 사상사 정도나 가능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실증사학을 지지한다. 물론 그들은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면서 고고학적 발굴이나 인류사적 문명의 흔적을 찾아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한 행로를 이어간다. 그들이 찾아낸 문서들과 기록들, 유적들·유물들 덕분에, 우리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에 묻혀 있는 역사적 사실에 그나마 조금씩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추정할 뿐 그대로 재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록과 기억이다. 기록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수적이다. 기록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확인조차 어렵고 단지 추정에 머물러 있게 된다. 기억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 각국은 각종 기념비든, 박물관이든 건립하고, 유적지도 보존하고자 노력한다. 독일의 경우에 나치 시절의 만행도 감추거나 은폐하기보다 적어도 역사적 사실인 한에서 공개를 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해국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나치에 의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고 배상을 하기도 했지만, 동아프리카 독일 식민지에서 저지른 민족학살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 엄밀히 말해, 현실은 선택적 사과 혹은 배상만 있을 뿐이다. 거기에는 국가적 이익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증사학의 한계는 현재의 사실과 거리를 두고 과거에만 매몰되어 버리고 만다는 데 있다. 현실을 떠난 역사란 죽은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와 같은 역사는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기도 하다. 거기에는 과거의 어두운 역사보다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만이 강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때론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원전 사료조차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사실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특정한 역사적 사실이 현재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정치사, 사회경제사, 문화사, 종교사 등등이 서로 얽혀있고 상호 작용을 통해 일방적인 한 국가의 역사가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국제적 관점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랑케가 근대사학의 기초를 실증주의와 경험론에 근거해서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과거를 재현하고자 하는 랑케의 역사관은 때론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장을 시켜버릴 우려도 분명히 있다. 고대 문명의 유적지를 둘러 보면, 지금으로서는 입증될 수 없는 것이 수없이 많다. 현재 입증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존재했지만, 현재 사라져버린 많은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와 반대로 입증될 수 있는 것만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 그 역사적 사실은 매우 제한적이다. 단적으로 근대사학 이후의 역사의 경우 문헌들이나 기록들이 남아 있어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데 고대사보다 더 용이하다. 실증사학은 실증주의(Positvismus)에 토대를 두는데, 실증주의는 사회학의 창시자인 이지도르 마리 오귀스트 프랑수아 크사비에 콩트(1798-1857)에서 기원한다. 콩트는 역사의 발전단계를 신학적 단계에서 출발해서 형이상학적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증적 단계로 구별했다. 마지막 실증적 단계에 의하면 현상을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가설을 입증하는 경험론의 방식이야말로 모든 현상을 신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신학적 단계와 모든 현상을 추상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형이상학적 단계를 벗어난다. 실증적 단계에 의한 방법론은 비교와 실험, 그리고 역사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실증주의가 역사에 적용되면 실증사학이 된다. 실증사학은 역사철학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역사철학은 역사에서 일정한 패턴과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역사의 의미와 그 가치를 연구한다. 그러나 역사에서 그와 같은 법칙이나 패턴이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되어 필연적 방식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역사의 현실에서는 우연한 발견과 착상이 인류에게 준 선물을 갖다 주는 경우라든가, 혹은 조그만 사건이 뜻밖에 혁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역사적 사실로서 입증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어쩌면 그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해석이나 추정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
- 칼럼
- Nova Topos
-
실증 사학의 문제와 그 한계
-
-
도시 속의 새로운 생명
- 문래동에는 방림방적으로부터 기부 채납받은 4,000여평의 빈 땅이 있다. 지난해까지는 그곳의 절반은 도시 텃밭으로 사용하고, 절반은 구청 창고로 사용하였다.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수년 동안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직 중에 서남권 균형개발의 목적으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2021년 11월에 중앙심사투자까지 완료하였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오세훈으로 바뀌자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던 그 계획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의도에 대형 선착장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계획과 연계하여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에 건설하겠다고 지난해 초에 발표했다. 그것도 여의도 공원의 절반쯤을 허물고 그곳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이 바뀌면 예전 시장 시절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계획도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바꿔버려도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에 건설하겠다고 한 후에 영등포 구청장은 구청 창고로 사용하던 곳을 도시 정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고, 곧 공사를 진행했다. 이제 내일모레면 공식 Open식을 개최한다. 내가 사는 아파트가 그곳 바로 옆에 있다. 아파트에서 나와 2차선에 불과한 도로만 건너면 정원이다. 나는 매일 그곳을 내려다보고 있었기에 정원 만드는 과정을 모두 다 알고 있다. 공사비는 20억 이상 소요되었을 것이다. 공사비는 서울시의 지원받았다. 같은 당 소속의 구청장이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로 이전할 것을 허락해 준 대가로 그 공사비를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아무튼 그렇게 하여 문래동 중심에 인공 자연이 형성되었다. 아파트에서 내려다보이는 정원은 작지만 아름다웠다. 2,000평의 규모는 정원으로 꾸미기에는 작지만, 그래도 구청 창고로만 활용했던 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했다. 2,000평의 둘레에는 황톳길이 만들어졌고, 그 안쪽으로는 우레탄으로 만든 길도 조성되었다. 일부 공간에는 각종 운동기구도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 놀이터와 이름 모를 작은 나무들과 함께 꽃밭도 조성되었다. 황톳길 둘레에는 수많은 나무가 심어졌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제외하면 모두 잔디가 심어졌다. 황톳길 둘레에는 가로등도 설치되었다. 또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흰색 지붕을 가진 조그마한 건물도 지었고, 그 옆에는 공중화장실도 만들어 놓았다. 곳곳에 설치된 등받이 의자와 지붕을 가진 쉼터도 만들어졌다.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모두 푸른빛이 나는 인공 자연이었다. 나는 매일 그곳을 내려다보면서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손자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생각과 함께, 아침저녁으로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간단한 운동과 황톳길을 맨발로 걷는 그림을 그려보곤 했다. 이틀 전에는 햇빛이 매우 따가웠다. 아내와 함께 우연히 그곳을 지나쳤는데, 나무를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뭇잎에 축 처져 있었다. 나무를 심는 과정도 모두 지켜봤기 때문에, 나무 둘레에 그름도 주고 물도 많이 뿌렸던 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뜨거운 햇빛에 나무는 힘겨워 보였다. 아내가 이야기했다. “나무도 제집이 아니면 처음에는 몸살을 앓는데요.” 그럴 것이다. 그곳의 나무들도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닌 새로운 곳에 뿌리를 내리기가 무척 힘들어 보였다. 비라도 내려서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고, 나뭇잎도 생기를 찾기를 희망했다. 그런데 어제는 온종일 비가 내렸다. 정원에 조성된 꽃들과 나무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오후에 아내가 부른다. “여보! 어쩌나? 저것 봐요. 나무가 쓰러졌어요!” 나는 창가로 가서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불지는 않았지만. 나무 두 그루가 꽁꽁 묶인 뿌리를 드러내 놓고 쓰러져 있었다. 다른 나무들을 삼각형 모양으로 나무막대로 지지해놓은 상태였기에 쓰러지지 않았다. 쓰러진 나무는 지지대가 없었다. 왜 저 나무들만 지지대가 없었을까? 나무의 고통이 나에게도 전해졌다. 살아있는 모든 것,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고통을 느낄 것이다. 동물의 권리를 주장한 피터 싱어나 톰 레건의 책을 아직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동물에게만 고통을 느끼고 그 나름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은 고통을 느끼며 그 나름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식물들의 생태계도 전쟁과 공생을 함께 한다고 한다. 자연의 모든 생태계가 그럴지도 모른다. 문제는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이다.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자연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들의 시각에서는 인간만이 이 지구의 주인이다. 기독교는 잘 모르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이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만약 그렇다면 데카르트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내가 아는 한 불교적 세계관은 인간 중심적이지 않다. 불교의 근본이 연기설이기 때문이다. 불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연기라는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노자와 장자도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무위자연과 제물론의 논리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는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하기에 여기서는 그만두기로 한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아픔을 느낀다는 생명 중심적인 세계관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새롭게 조성된 인공 자연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뿌리를 내리기를 소망해 본다. 생명 그 자체는 쉬움 없이 흐르는 물과 같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불꽃일까?
-
- 칼럼
- Nova Topos
-
도시 속의 새로운 생명
-
-
2015년 4월 2일, 벨라루스 "사회적 기생충 방지법"의 "실업세" 청구에 대한 시위
- 2015년 4월 2일, 벨라루스는 연일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시위 구호는 ‘실업세 반대’이다. 실업세라는 것은 더 일할 수 있는데도 반년 이상, 183일을 기준으로 일하지 않고 국가 고용센터에도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460벨라루스 루블(약 28만원)을 물게 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비롯된다. 평균 월급의 절반이 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벨라루스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대상자 가운데 돈을 낸 사람 또한 10%도 안 될 정도이다. 같은 날, 벨라루스의 두마 의회에서는 고령자나 장애인, 학생 등을 제외하고 무직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매년 벌금을 내게 하는 정책인 '사회적 기생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명분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복지 혜택에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는데, 소득이 없거나 기준치 이하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이기에 이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와 같은 실업세는 옛 동독에서도 존재했던 종류의 세금이었다. 본래 실업세는 2015년 ‘건강한 국민이 노동에 종사하면서 정부 지출의 일부를 감당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자’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예외는 학생과 장애인, 55세 이상 여성, 60세 이상 남성, 3자녀 부모 등으로 국한했었다. 경제 활동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선출된 것이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이 법안을 두고 놀고 먹는 사람을 없애자는 뜻에서 ‘사회적 기생충 방지법(Дэкрэта аб дармаедах)’으로도 불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가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노동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했다. 벨라루스는 옛 소련과 같이 중앙집권적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영 기업에 퇴직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노동력이 모잘라 한계에 부딪치는 상황이다. 2012년에는 임업에 관련된 기업, 2014년에는 국영 농장 근무자들에게도 퇴직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2015년 이후 러시아 경제가 흑해 병합과 돈바스 전쟁의 유도 등으로 경제 제재를 당하게 되자 벨라루스는 경기 침체라는 직격탄을 맞아 ‘준비 안 된 실업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실업세 대상자도 늘어났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실업세법은 과거 소련에도 존재했었다. 일자리를 잃은 것도 슬픈 일인데 세금까지 짊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뜨 정책 이후로 완전히 없어졌다. 물론 어느 나라나 실업 문제는 국내 문제 중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다. 이는 생산과 복지 문제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북유럽의 핀란드가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것도 이러한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기존 실업수당과 달리 실업자에게 아르바이트 등의 저임금 일자리가 생겨도 월 70만원을 보장하는 대신 각종 복지 제도를 없애는 것이 기본 정책이다. 이에 따른 복지 투자에 대한 행정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벨라루스가 겪고 있는 실업 문제 현상이나 핀란드에서 포퓰리즘을 줄이는 실험은 모두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생긴 일이다. 도덕적인 헤이를 방지하고 근로에 대한 의욕을 높이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는 없는 것일지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루카센코 대통령이 이 세금 제도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해왔다. 물론 시민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했고 집단으로 납부를 거부하여 벌금에 대한 납부율이 떨어질 것도 예상했다. 특히 벨라루스 국민들과 야권은 정부를 대상으로 이 법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고 이에 루카센코 정부 퇴진과 친유럽 성향 정권으로 바꾸자는 반(反) 정부 시위로도 확산되었다. 벨라루스 민영 뉴스업체인 벨라판(Bela PAN) 뉴스 컴퍼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이크를 든 야당 연합자유당(UCP) 대표 아나톨리 랴베즈카(Анатолий Рябезкa)는 시위에 모인 시민들에게 ‘법령 3호’에 맞서 행동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4월 17일, 수도 민스크에 2,000명의 시민들이 모여 시작된 시위가 지방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같은 날 벨라루시의 북동쪽 비쩹스끄 승리 광장에도 200명이 시위를 벌였으며 남서쪽 브레스트에도 100명이 모여 ‘법령 3호’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시위자들은 “나는 기생충이 아니다(Я не паразит)”라는 손피켓을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5월 15일에는 수도 민스크에서 더 큰 시위를 벌일 것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회적 기생충 방지법’인 "법령 3호"는 소련 시절의 법령을 발표할 때 상세한 법 조항이 아닌 숫자로 입법 절차의 순서를 매겨 OO 1호, OO 2호, 순으로 불리고 있다. 국민들의 사회적인 의존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루카셴코 정부가 이미 2010년 1월부터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법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연금은 삭감되고 정년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황으로 인한 민생고를 국민에게 전가시켜 국민의 소득을 더 감소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벨라루스 시민들 입장에서 대표적인 "악법(Закон)"이다. 벨라루스의 경제는 2015년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많은 벨라루스인들은 러시아에서 일하면서 집으로 돈을 부친다. 민스크에 모인 시민 행동 ‘분노한 벨라루스인의 행진(Люты беларускі марш)’은 당국에 법령 3호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달 안에 정부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새로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며 경고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2020년 6선에 성공해 1994년부터 현재까지 28년째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서방 언론들은 루카셴코 정부를 유럽의 마지막 독재정권이라 부르고 있다.
-
- 칼럼
- Nova Topos
-
2015년 4월 2일, 벨라루스 "사회적 기생충 방지법"의 "실업세" 청구에 대한 시위
-
-
한국의 어린이 날인 오늘은 러시아에서는 "정교회 부활절"
-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 이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나서 돌아오는 일요일이다. 이 같은 규정은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세가 325년 소집한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됐다. 춘분이 양력으로 3월 21일 전후이므로 이르면 3월 22일, 늦을 때는 4월 26일이 부활절이 된다. 실제로 2008년에는 부활절이 3월 23일, 2011년에는 4월 24일이었다. 불과 3년 사이에 한 달이나 차이가 난 것이다. 하지만 부활절이 5월인 경우도 있다. 정교회에서는 가톨릭, 개신교 등과 달리 4월 4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부활절이 온다. 이처럼 카톨릭과 정교회의 부활절 날짜가 다른 것은 사용하는 역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카톨릭과 개신교는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그레고리력을 채택했지만, 정교회는 전통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초기 교회가 쓰던 율리우스력을 고수하고 있다. 본래 러시아의 어린이 날은 6월 1일인데 1949년 국제민주여성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제정한 '국제 어린이 날(International Children's Day)'이 근원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소련 시절에는 상당히 큰 기념일이었지만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 그 의미가 축소되어 거의 눈에 띄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금 본격적으로 행사를 치르기 시작한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중앙아시아 등의 국가들은 모두 6월 1일을 아동절로 지정하고 있는데 아동절은 북한에서 지정한 단어로 러시아에서는 "젠 젯쩨이(День детей)"라고 불린다. 러시아에서 어린이 날이 큰 기념일로 다시 탄생한데는 원래 취지인 어린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혹 행위를 반대한다는 것 외에 한 가지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다. 이는 러시아의 인구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다. 러시아는 지구 육지의 1/6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국가이다. 하지만 인구수를 보면 그 영토 크기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2010년에 실시된 러시아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총 인구수는 1억 4천 3백만 명이다. 인구 수로만 따지면 간신히 세계 10위권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그나마도 이 인구수는 2002년에 조사한 것에 비해 200만 여명이 줄어든 결과로 나타난다. 그 원인은 한국의 인구가 하락한 이유와 별 차이가 없다. 노년층이 죽는 것에 비해 젊은 층의 출산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전통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저변이 넓고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러시아인데도 나타나는 이와 같은 출산율 저하는 러시아 국가 발전의 저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부족한 인구수를 충당하기 위해 정책적 실시하고 있는 노동 이민은 결과적으로 여러 사회 문제를 양산하고 있어 러시아 정부의 뜻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러시아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 보조를 강화해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러시아의 기본 정책 목표는 인구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인구수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러시아 정부가 감안하고 있는 국가 인구수의 마지노선은 1억 4천만 명 수준으로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기본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러시아에서 어린이 날이 다시금 큰 행사로 재조명되고 도심에서 큰 기념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와 같은 국가 상황 및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도시마다 행사 규모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6월 1일 러시아의 공식적인 여름의 첫 날이자 어린이날을 맞이해 각 도시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 내부 시민 수 1위를 점유하고 있는 모스크바 도심 고리키 공원은 시민들이 몰려들어 인근 교통상황이 마비되었을 정도인데 시민들 대부분이 어린이를 대동한 가족 단위의 인파들이었다. 고리키 공원은 모스크바 시에서 지정한 공식 행사 장소로 알려져 있다.
-
- 칼럼
- Nova Topos
-
한국의 어린이 날인 오늘은 러시아에서는 "정교회 부활절"
-
-
5월 7일에 세르비아에 방문 예정인 시진핑 주석과 세르비아-중국 간의 경제 협력
- 세르비아와 중국의 경제 협력 동기는 더욱 분명하다. 첫 번째 세르비아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에는 경제발전 속도를 높이고 미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 확 영향을 미치는 고속도로, 철도, 교량 등 인프라 프로젝트가 필수적이다. 두 번째 세르비아의 스메데레보(Smederevo) 같은 대형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영기업들은 수천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막대한 적자를 국가 예산으로 메워야 하는 실질적인 ‘폭탄’이나 다름 없었다. 수 년간 자국 국영기업에 투자하려는 전략적 파트너를 찾게 된 세르비아 정부는 중국 기업들의 관심을 좋아하면서 우선 세르비아 내에 자리 잡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했다. 그 동안 세르비아 경제는 최대 투자국이자 세르비아 상품의 최대 수입국인 EU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었다. EU는 세르비아 수출품의 3분의 2를 수입했다. 따라서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세르비아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EU와 발칸지역에 대한 과도한 노출 위험을 다소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 기업을 끌어들이려 했던 것이다. 이는 EU 가입에 대한 절차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EU 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사실상 가입이 중단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입장이다. 그리고 세르비아가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한 현상이 지식과 수출 기반 경제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세르비아가 지난 20년간 유치한 투자는 대부분 섬유나 케이블과 같은 저부가가치 산업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투자 당시 자국의 노동력과 공급자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세르비아 국내 건설사들은 중국 투자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누리지 못함에 따라, 세르비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세르비아의 국영기업인 스메데레보 철강공장과 보르(Bor)에 있는 구리 생산업체를 인수했다. 양사 인수 금액은 총 3억 6,000만 달러(약 4,300억 원) 정도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양사 모두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세르비아 정부에게 있어서 민영화만이 유일한 탈출 전략이었기에 이는 중국이 원하는 조건과 맞아 떨어진 상황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세르비아의 부치치 대통령은 세르비아가 유럽에서 중국의 유일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헸다. 중국은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동유럽 시장을 확대함에 따라 세르비아에 대한 투자는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치치 대통령은 다변화의 전략의 형제 국가인 러시아의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중국은 몬테네그로(Montenegro)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인 바르-볼랴레(Bar-Boljare)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이곳 크로아티아에서도 몇몇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크로아티아 남부에 있는 펠예사츠(Peljesac) 대교를 건설했다. 펠예사츠 대교는 길이 2.4㎞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일부 지역을 지나 크로아티아 본토와 최남단 두브로브니크 네레트바주 펠예사츠 반도를 연결한다. 이전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네움 지역을 지나가야 해서 두보르브니크는 크로아티아의 역외 영토로 분류됐었는데 펠예사츠 대교가 건설되면서 스플리트에서 두보르브니크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영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연결하여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어 EU 국가 중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헝가리와 이탈리아 같은 다른 EU 회원국들도 중국 기업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여왔고 중국은 유럽에서 크게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기업과의 협력 및 확대 시 몇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우선, 중국 기업들은 EU 시장 진출을 위해 서구 금융기관들보다 종종 더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원칙없는 융통성은 양날의 검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몬테네그로의 바르-볼랴레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경우도 국제 개발 은행들로부터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중국 수출입 은행(CHEXIM)은 이를 수용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다. 중국 파트너들은 투자에 유연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된 다른 위험에 대해서도 더 유연한데 중국 파트너들은프로젝트가 공공부채 증가나 지속적으로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세르비아에서 스메데레보와 보르 투자는 반대로 해당 지역에 심각한 환경 파괴 문제를 낳았다. 세르비아 정부가 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무시한 채 중국 파트너들과 어느 정도 타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뒷거래가 성사되었는지에 여전히 의문에 있다. 세르비아는 중국과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EU 가입이라는 견해를 버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세르비아가 EU 가입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개발 목표를 존중하고 EU의 기준을 충족하는 게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세르비아가 EU 가입을 계속 희망하는 이상 중국과 계속 긴밀한 경제 협력을 유지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일 수 있지만 중국과 관계가 불안해질 때를 고려하여 이는 하나의 보험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
- 칼럼
- Nova Topos
-
5월 7일에 세르비아에 방문 예정인 시진핑 주석과 세르비아-중국 간의 경제 협력
-
-
세르비아인들이 알고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초대 대통령 알리야 이제트베고비치(Alija Izetbegović)와 빌 클린턴
- 이제트베고비치는 전형적인 보슈냐크인이다. 이제트베고비치를 이해하려면 보슈냐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슈냐크인은 보산스키 무슬림(Bosanski Muslimani)을 뜻하는 말이다. 한국에서는 보스니아인으로 통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보스니아인이라는 표현은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는 민족이 아닌 종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구성 민족은 무슬림이 아닌 기독교인도 많으며 보스니아 민족주의 운동이 발흥하던 시기에는 가톨릭을 믿는 보스니아인들도 많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스니아인과 보슈냐크인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즉,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모든 시민들이 보스니아인이고 보슈냐크는 보스니아인 중 무슬림인 보스니아인을 통칭하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 보스니아와 보슈냐크의 개념과 그 차이를 이해해야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이해가 빠르다. 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거주하는 보슈냐크인은 178만 명 정도다. 보슈냐크가 생성된 시기는 오스만투르크 제국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스니아 땅은 당시 세르비아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세르비아 정교회 신자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던 지역이었는데 세르비아 왕국이 오스만투르크에게 멸망하면서 다수의 투르크인들이 보스니아 땅에 들어와 정착하게 되었다. 당시 오스만투르크는 비무슬림들인 세르비아인들에게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다. 투르크 지배자들은 정교회를 인정해주는 대신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은 어느 정도 가산을 가지고 있던 세르비아 중산층까지는 세금 내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세금낼 돈이 없는 세르비아의 하층민들에게 있어 이는 매우 고역인 제도였다. 따라서 세금낼 돈이 없는 세르비아의 하층민들은 정교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해 세금을 면제했다. 그리고 이들 개종한 세르비아인 무슬림들 중 딸들은 투르크 지배층들과 통혼하여 이들의 혼혈 자손들이 보스니아에 이슬람을 신봉하면서 새로운 민족 개념이 탄생한다. 이들이 바로 보슈냐크인 1세대라 할 수 있다. 이제트베고비치는 자신의 고조부가 무슬림으로 개종해 투르크인 여성과 결혼한 혈통 사이에서 4세대가 지나 탄생한 모계 투르크 혈통의 보슈냐크였다. 지금도 80% 이상의 세르비아인들은 이제트베고비치를 4세대 투르크 모계 혈통의 보슈냐크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역사적으로도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투르크 모계 혈통의 보슈냐크인들은 투르크 부계 혈통의 보슈냐크들보다 훨씬 더 원리주의 이슬람의 성격을 띄었다. 이제트베고비치는 이와 같이 엄격한 무슬림 가정에 자랐고 15세의 어린 나이로 믈라디 무슬리마니(Mladi muslimani)라는 집단에 들어갔다. 믈라디 무슬리마니(Mladi muslimani)는 세르비아어로 "청년 무슬림들"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굉장히 과격한 원리주의적 성격을 지닌 집단이었고 1941년 4월, 나치 독일의 괴뢰국인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독립 및 창설에 기여했다. 이 나치 괴뢰국가는 인구 630만 명의 소국으로 출발했다. 당시 가톨릭 신자인 크로아티아인이 330만 명, 정교회 신자인 세르비아인이 200만 명, 무슬림 보슈냐크인이 70만 명으로 복잡한 국가 형태를 가졌고 보슈냐크인들이 주도한 믈라디 무슬리마니는 수적으로 열세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크로아티아 내무성 직할부대 우스타샤와 세르비아 왕정복고주의 의용군 체트니크(Четник)의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었다. 이에 나치인 하인리히 힘러는 믈라디 무슬리마니의 불만을 전쟁에 이용할 계획을 세웠고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의 시조이자 아랍민족주의 투쟁운동가인 아민 알 후세이니(Amin Al-Huseini, 1897~1974)의 영도 아래 나치가 되어 프랑스 전선에 투입되기도 했다. 당시 이제트베고비치 또한 17세의 어린 나이에 대프랑스 전선에 투입되었는데 이 때 나치 활동을 하면서 전투 능력과 학살 등의 잔혹함 등을 습득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보슈냐크 나치는 후일 제13무장산악사단(13.Waffen-Gebirgs-Division der SS)이라 알려진 한트샤르(Handschar)이다. 세르비아인들은 이제트베고비치를 "나치"로 여기고 있다. 물론 보스니아, 보슈냐크인들은 이제트베고비치를 해당 나치 논란을 부정함과 동시에 그가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 출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가 파르티잔을 활동했다는 근거는 매우 미약한 편이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이 세워지면서 이제트베고비치는 1950년, 25세의 나이로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에 보슈냐크 대표로 입당한다. 그러나 그는 반유고적이고 유고슬라비아가 반동으로 여기던 이슬람 원리주의를 대표하고 있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는 유물론의 입장에서 종교를 반대하던 공산주의적인 색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종교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과격한 색체가 들어가 있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혐오했다. 게다가 요시프 티토는 믈라디 무슬리마니(Mladi muslimani)를 굉장히 혐오했는데 이제트베고비치는 왕성한 이슬람 관련 저술 활동을 하여 티토의 눈밖에 났고 그는 여러 차례 투옥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저술이 1970년에 발표한 <이슬람 선언(Islamska deklaracija)>이었다. 이 책은 보슈냐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원리주의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의 무함마드 진나(Muhammad Jinnah, 1876~1948)를 모델로 삼고 있었다. 이 책의 파장은 생각보다 엄청났다. 티토는 이에 격분하여 <이슬람 선언(Islamska deklaracija)>을 금서로 지정하고 이제트베고비치를 "국가전복혐의(Државна субверзијска накнада)"로 체포했다. 이제트베고비치는 첫 공판에서 사형을 언도 받았지만 보슈냐크인들의 반발과 이로 인한 폭동을 우려한 티토와 공산당 정부는 이제트베고비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후, 1980년 티토가 사망하면서 이제트베고비치는 유고슬라비아 내 종교적 화합을 명분으로 석방되었고 1990년까지 약 10년 동안 보슈냐크인들의 공산당 대표를 지냈다. 이후, 유고슬라비아의 해체 작업에 들어가면서 그는 보스니아 민주행동당(Stranka demokratske akcije)을 창당하여 당수가 되었고 미국과 나토에 협력해 유고슬라비아를 쪼개는데 앞장섰다. 그는 미국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1990년 자유선거에서 세르비아 민주당의 라도반 카라치치(Радован Караџић)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고 보스니아의 독립 추진에 나섰다. 그리고 크로아티아계 정당들과 합의해서 1992년 보스니아 독립 투표를 실시, 세르비아계의 보이콧으로 인해 독립할 수 있었다. 세르비아인들은 보스니아의 독립을 유고슬라비아를 쪼개려던 미국의 도움으로 인해 독립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트베고비치를 미국과 나토에 협력해 수많은 세르비아인들을 학살자로 여기고 있다. 19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이제트베고비치는 보스니아 무슬림들을 이끌고 전장에 있었다. 그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고 있었고 세르비아를 상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원했다. 그렇기에 자신이 이끄는 보스니아 무슬림들, 보슈냐크와 피를 맺어진 형제들과 함께 싸우길 원했다. 그는 클린턴에게 세르비아와 전투를 벌이기에 자신의 병력과 무기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세르비아인들은 당시 이제트베고비치의 구원요청에 응하여 클린턴이 투입한게 원리주의 집단 무슬림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펀자브 일대에서 활동하던 "오사마 빈 라덴"의 무리들이냐 물어보니 그들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굉장히 호전적인 무슬림들" 이었다고 답했다. 그래서 나는 리처드 펄(Richard Perle), 빌 클린턴이 어떤 사람들인지 물었다. 그들은 "세르비아,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 친구, 친척들을 파괴한 전쟁범죄자"라고 답했다. 적어도 이 전쟁을 겪었던 세르비아인들은 클린턴과 이제트베고비치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었고 이들은 세르비아의 극우주의자가 되었다. 이분들과 대화 이후, 나는 나름대로의 자료를 찾아보며 내가 공부했던 것들과 비교 분석하여 이를 재구성했다.
-
- 칼럼
- Nova Topos
-
세르비아인들이 알고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초대 대통령 알리야 이제트베고비치(Alija Izetbegović)와 빌 클린턴
-
-
중남미의 파나마, 내일 대선과 총선을 조망해본다.
- 그 동안 파나마는 글로벌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운하가 거대한 시련을 겪고 있었다. 파나마 운하는 2023년 여름부터 일일 통과 선박을 35→31→21척 등으로 각각 줄여 왔다. 그리고 현 2024년 2월에는 다시 18척으로 축소했다. 이는 엘니뇨로 인한 가뭄으로 인해 수량이 부족해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 역할을 맡고 있다. 현대의 함선들은 크기가 워낙 거대해져 통과 선박 크기에 제한이 있다. 파나마 운하의 높이는 해수면보다 최대 26m로 높은 편이다. 선박들은 도크에 들어온 뒤 물을 채워 더 높은 위치의 도크로 올라가게 되고 운하 중간에 위치한 가툰 호수를 거쳐 다시 도크로 들어가 물을 빼 내려가며 계단식으로 운하를 통과하여 바다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갑문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물은 가툰 호수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데 현 파나마 최악의 가뭄은 가툰 호수의 물을 말려 바닥을 드러낼 위험에 처해지고 있는 것이다. 가툰 호수의 위기는 곧 파나마 운하의 효용성의 위기와도 직결된다. 파나마 운하는 갑문식으로 만들어져서 비록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무려 20,000km 이상을 돌아가야 하는 것에서 단 하루 정도로 건너갈 수 있게 되자,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건너가는 선박들과 반대로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건너가는 선박들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게 되었다. 결국 파나마 운하는 건설비에 들어간 비용 이상을 통행수수료로 쉽게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인데 파나마 국가 경제의 80% 이상을 이 운하의 통행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 파나마는 1인당 GDP가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드는 나라로 2010년대 중남미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볼리비아와 함께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힌다. 사실상 이 운하 하나로 중남미에서 일약 잘 사는 나라로 손꼽히게 됐는데 1인당 GDP가 14,618달러로 개발도상국 수준을 넘어 중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파나마 운하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루아침에 최빈국으로 나락 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글로벌 물동량 5%, 화물선의 약 40%가 통과하는 파나마 운하의 통과 선박 감소는 글로벌 물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데 파나마 운하에 문제가 생긴다면 파나마 다음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파나마 운하 통과 선박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해와 북해가 없는 미국 입장에서 해운으로의 동, 서 무역 연결은 파나마 운하 밖에 방법이 없다. 미국 입장에서도 파나마 운하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 정부에 반환하면서 이를 관리할 관리비를 비롯, 상당 양의 달러를 파나마에 퍼줬다. 그렇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의 위기는 미국 경제의 위기, 미국 국가 안보의 위기로도 직결된다. 자국을 방어하는 미 해군 군함들이 동서를 왕래하기 위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두 운하에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면 글로벌 해상통상로가 (무역선들이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과 남미 남단의 마젤란 해협으로 돌아가야 했던) 18세기로 퇴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는 당사 국가인 파나마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니카라과 운하 프로젝트(Nicaragua Canal Project)이다. 사실 니카라과 운하의 건설은 20세기 초에 미국이 추진하다가 파나마 운하 건설권을 프랑스로부터 4,000만 달러에 넘겨받으면서 포기한 프로젝트였다. 이후 니카라과가 친러, 친중 국가가 되면서 2012년 9월 26일, 니카라과 정부와 중국의 홍콩 니카라과 운하 개발(HongKong Nicaragua Canal Development, 이하 HKND)은 니카라과 운하를 건설하기로 협의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니카라과 운하 건설업체로 선정된 HKND는 왕징(王靖)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이 프로젝트의 총 건설비가 400억~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를 위해 니카라과의 의회는 HKND의 개발 참여를 승인했고 이를 통해 HKND는 니카라과 운하 개통 후 100년간의 운하의 건설과 관리, 개발의 권리를 갖게 되었으며, 운하 건설과정에 필요한 보조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의 건설도 허가받았다. 태평양 연안의 브리토 강에서 나카라과 호수를 거쳐 카리브 해 연안의 푼타 고르다 강까지 총 길이가 278km에 달한다. 니카라과 운하의 폭은 최소 230m에서 최대 520m이며, 수심은 27.6m로 확장 공사를 한 파나마 운하는 길이 82km, 폭은 55m, 수심은 18.3m로 니카라과 운하보다 규모가 작다. 파나마 운하는 최대 8만 t의 선박이 오갈 수 있는데 니카라과 운하는 선박의 최대 적재톤수가 최대 25만 t이나 된다. 이게 완성되기라도 하면 이미 파나마 운하와의 경쟁력에서 앞서게 되는 것이다. 이게 완공되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니카라과 운하를 갖게 되면 향후 100년 동안 미국의 동, 서 물류와 무역의 항로까지 틀어 쥘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왕징의 금융 손실로 인해 HKND가 니카라과 프로젝트에서 손을 땠고 2018년 2월에 HKND는 홍콩 본사를 폐쇄한 채 유령 회사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곳을 중국 정부가 다시 손을 대기 위해 니카라과와 서서히 접촉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파나마에도 손을 뻗치고 있는데 니카라과가 안 되면 언제든지 파나마로 옮길 수 있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일종의 보험용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당장 내일 있을 5월 5일 파나마의 대선에 당선이 유력한 호세 라울 물리노(Jose Raul Mulino) 전 공공 안전부 장관이 친미성향을 갖고 있지만 친중성향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이다. 파나마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도 가장 먼저 참여했던 국가 중에 하나이고 물리노도 중국과의 관계와 미국과의 관계를 두고 중립적인 입장을 받아들이되,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중단 없이 계속 실행하겠다고 했다. 전임 대통령이었던 마르티넬리는 부패 혐의로 미국 입국이 금지된 반면, 물리노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파나마 대선이 총선과 함께 치뤄지는 이유는 전 대통령인 리카르도 마르티넬리(Ricardo Martinelli)가 최근 공공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유죄 판결이면서 대통령으로써의 자격이 박탈당했다. 따라서 8명의 대통령 후보자가 나타나 5월 5일 선거를 치르게 된다. 파나마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가 최근 투자 등급에서 파나마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가운데 파나마의 경제적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파나마 운하 문제의 해결, 그로 인한 최근 떨어진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마틴 토리호스(2004~2009) 전 대통령과 2019년 선거에서 2위로 머무른 로물로 루(Rómulo Roux)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강조하면서 경제 안정을 회복하겠다는 공약을 바탕으로 유세를 벌였고 리카르도 롬바나(Ricardo Lombana)는 노동자들, 특히 구리 광산 시위 당시 그들의 지지를 받으면 철저한 좌파 성향인 인물로 우파의 부패를 척결하자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마르티넬리의 후임자로 지명된 호세 라울 물리노(José Raúl Mulino)의 공약은 다소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지만,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그는 파나마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물리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과 중국 모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 미국은 반도체와 같은 산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파나마에서 외교적 입지를 강화했고 중국은 파나마 인프라 개선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보다는 중국에 쏠려 있는 경향이 다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인 파나마 운하의 담수를 해결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내일 그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 칼럼
- Nova Topos
-
중남미의 파나마, 내일 대선과 총선을 조망해본다.
-
-
Revealing the Face of Our Ancient Kin: The Neanderthal Woman of Shanidar
- Transport yourself back 75,000 years ago amidst a rugged landscape where early humans and their enigmatic relatives, the Neanderthals, roamed. Imagine encountering one of these ancient beings face-to-face, peering into the eyes of a creature so similar yet distinct from ourselves. Thanks to modern science's marvels and intrepid researchers' dedication, we've been granted a glimpse into this distant past. In a tale almost lifted from the pages of a gripping archaeological adventure, scientists have unveiled a stunning recreation of a Neanderthal woman, breathing life into the fragments of a skull discovered in the depths of Iraq's Shanidar cave. But this wasn't a simple task; the skull's bones were as fragile as a "well-submerged biscuit," requiring delicate handling akin to piecing together a centuries-old puzzle. The fragility of these bones, so ancient and yet so delicate, is a testament to the passage of time and the resilience of our human ancestors. With meticulous care, the shattered remnants were fortified and meticulously reassembled, offering a tantalizing glimpse into the visage of our ancient relative. Guided by the expertise of paleoartists, a three-dimensional model emerged, casting light on the features of a being who once walked the earth alongside our ancestors. The model revealed a robust, heavily browed face, a characteristic feature of Neanderthals, and a cranial capacity similar to that of modern humans. This remarkable reconstruction, which you are about to witness, takes center stage in the forthcoming documentary "Secrets of the Neanderthals," a collaborative masterpiece between BBC Studios and Netflix. Dr. Emma Pomeroy, a paleoanthropologist from the University of Cambridge who was involved in the project, shares her excitement: "It can help us connect to who they were. It's fascinating and a huge privilege to work with the remains of any person, but especially one as special as she is." Your interest and curiosity are integral to this journey. The journey to resurrect this ancient face began with the discovery of the fragmented skull within the cavernous depths of Shanidar, a site that has yielded a wealth of Neanderthal remains. Nestled amidst the remains of fellow Neanderthals, the find sparked renewed interest and intrigue. Professor Graeme Barker of Cambridge, leading the excavation, describes the skull's initial state as 'essentially flat as a pizza,' a stark contrast to the lifelike form it would eventually assume. The process of resurrection was arduous, requiring delicate handling and painstaking reconstruction. With the blessings of local authorities, the fragile fragments embarked on a voyage to the UK, where they underwent meticulous stabilization and assembly. This was a collaborative effort, with experts from various fields, including paleoanthropology, archaeology, and forensic science, pooling their knowledge and skills to bring this ancient face back to life. The result? A reborn skull, ready to divulge its secrets to modern eyes. However, the significance of this discovery extends beyond mere aesthetics. As the researchers delved deeper, they uncovered clues to the Neanderthal's identity. While the absence of pelvic bones posed a challenge, dominant proteins in tooth enamel hinted at a female lineage. Moreover, the worn-down teeth suggested a life marked by experience, indicating that this enigmatic woman likely traversed her world for over four decades. This discovery is a key puzzle piece in our understanding of human evolution, inviting us to question and explore our shared past. As we marvel at the striking sculpture gracing our screens, let us not forget that the true treasure lies in the bones. Each fracture and fissure tells a story, offering a bridge to our shared past and illuminating the mysteries of our evolutionary journey. Through the eyes of this Neanderthal woman, we catch a fleeting glimpse of our ancient kin, reminding us of the intricate tapestry of life that binds us across millennia.
-
- 칼럼
- Thoughts Of Seraphine
-
Revealing the Face of Our Ancient Kin: The Neanderthal Woman of Shanidar
-
-
제국주의 집단 서방에 저항한 이집트의 마지막 불꽃 메흐메트 알리 파샤(Mehmet Ali Pasha, 1769~1849) 이야기 - 후편
- 1821년 그리스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시도한 반란이 발생하게 된다. 오스만 제국은 이전에도 그리스에서 반란이 여러 차례 발생했으나 모두 진압에 성공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반란 진압에 나섰으나 이번에는 예전과는 달리 그리스 독립군의 격렬한 저항에 쉽게 진압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그리스 인들의 격렬한 저항에 당황한 술탄 메흐메트 2세는 메흐메트 알리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알리는 본국에 지원군을 보내주는 대가로 크레타와 모레아를 얻으며 자신의 이집트 총독 자리를 임명직에서 세습직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으며 그리스 독립군에 의해 한시가 급했던 술탄은 알리의 요구를 수용했다. 곧바로 알리는 이브라힘 파샤를 사령관으로 한 지원군을 그리스로 파견했다. 그런데 그리스 독립군 내부에서는 지휘권을 두고 독립군끼리의 내전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내전의 피해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스만-이집트 연합군과 맞서 전투를 치뤄야 했고 결국 대부분의 영토를 점령당하고 오스만-이집트 연합군에게 진압당하기 직전까지 가게 된다. 그리스에서 이집트 군은 대대적인 학살과 약탈, 파괴를 일삼았으며 포로가 된 그리스 인들은 모두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아 버렸다. 메흐메트 알리는 자신의 그리스 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해 그리스 인들을 모두 살해하고 이집트 인들을 차출해 그리스에 정착시키려 했다. 그러나 오스만-이집트 연합군의 잔혹한 행위에 분노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3대 열강들이 그리스 독립군의 지지하여 그리스 독립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 이들 3대 열강들은 오스만-이집트 연합군에게 그리스의 반란 진압을 중단하고 그리스를 오스만 제국 산하의 자치국으로 남기는 내용의 타협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반란을 진압하기 직전, 오스만 제국과 이집트는 열강의 제안을 당연히 거부했다. 이에 열강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였기에 나바리노(Navarino)에서 해전을 치르게 된다. 이후 열강들의 군사력으로 인해 그리스 일대의 오스만-이집트 연합군을 무장해제시키며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집단 서방 열강들과 러시아는 그리스 민족에게 자결권이 있음을 선포하였으며 이후 직접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에게 추가로 전쟁을 선포하여 오스만 제국을 격파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오스만 제국은 아드리아노플 조약에서 그리스의 독립을 인정하게 된다. 술탄을 도와 전쟁에 참전했지만 전쟁에서는 패배했고 결국 얻지 못한 메흐메트 알리는 대신 시리아라도 주고 자신이 맡고 있는 이집트 태수직위를 자손들한테 세습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집단 서방이나 러시아에 몰려 있는 술탄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메흐메트 알리는 1831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반란을 일으켰다. 이미 알리는 프랑스 장교들을 훈련 교관으로 영입하고 이집트 군의 지휘를 맡긴 상태였다. 이로써 이집트 군은 오스만 군을 격파하고 순식간에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다. 오스만 제국이 야심차게 추진한 탄지마트 개혁이 완료되지 않았고 신식군대로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숙청된 예니체리들의 흔적이 여러 곳에 남아있었다고는 하나 이집트 군에게 쉽게 패배한 심각한 졸전이었다. 이집트 군은 여세를 몰아 오스만 제국의 수도 코스탄티니예로 진격했고 오스만 제국의 본토인 아나톨리아 중부의 콘야까지 진출했다. 알리를 막아낼 수단이 없어진 메흐메트 술탄은 다급히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했고 러시아는 이를 승락하여 아나톨리아로 내려와 이집트 군을 상대했다. 여기에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을 자신들의 영향권에 넣어 완전히 지중해로 내려올 것을 우려한 영국과 프랑스 역시 개입하여 메흐메트 알리와 메흐메트 2세 술탄에게 휴전하라며 압력을 넣었다. 결국 1833년 오스만 제국은 나라를 보전하고 이집트는 형식적인 속령으로 남았으나 크레타와 시리아, 헤자즈 등을 모두 메흐메트 알리에게 내주어야 했다. 이후 크게 굴욕을 당한 메흐메트 2세는 메흐메트 알리한테 복수하고 상실한 국토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이 지도하는 탄지마트 개혁에 가속도를 붙였다. 이와 같은 오스만 재국의 대대적인 근대화에 오스만 제국은 조금씩 근대적인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한편 메흐메트 알리는 오스만과의 주종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이집트의 독립을 노리기 시작했다. 이에 오스만 제국과 이집트 사이에 다시 불화가 시작되었고 휴전을 맺은지 6년 후인 1839년 근대화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한 메흐메트 2세는 8만 대군으로 시리아 침공을 지시한다. 그러나 오스만 군이 완전히 근대화 되어 서구 열강처럼 강군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 오스만 군은 헤지브 전투에서 4만여 명의 이집트 군에게 대패했고 알렉산드리아를 봉쇄하기 위해 출항했던 오스만 제국의 해군은 함대 전체가 알리에게 투항하였기 때문에 메흐메트 2세는 홧병으로 쓰러져 지병이던 결핵이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했다. 급사한 메흐메트 2세를 승계하여 어린 나이의 압둘메지트 1세가 갑자기 술탄 자리에 올랐고 권력의 공백을 이용하여 메흐메트 알리는 옛 이집트-시리아 왕국을 재건하여 독립하는 것을 넘어 코스탄티니예까지 정복해 오스만 제국을 승계할 새로운 이슬람 제국을 세우겠다는 야심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19세기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의 입장에서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가 지중해로 내려오는 것을 막는 완충국가로서의 가치가 있었다. 그와 같은 오스만 제국이 프랑스의 지원을 받는 이집트에 의해 완전히 와해되어 세력의 균형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은 오스만 제국의 편을 들어 개입하였으며 오스만 제국과 동맹 관계이던 러시아, 그리고 또 다른 열강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프로이센 제국까지 이 사태에 개입하였기에 메흐메트 알리에게 시리아 영유를 조건으로 여기까지 하라며 압력을 넣었다. 그러나 프랑스라는 배경을 두고 있던 메흐메트 알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영국은 대규모 함대를 파견하여 이집트와 시리아 해안을 포격해 붕괴시키고 열강 연합군에 의해 이집트 군이 크게 패하자 결국 메흐메트 알리는 열강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의 형식적인 속령으로 남게 된다. 결국 크레타와 시리아, 헤자즈를 반환하고 군대 규모를 축소한다. 그러나 처음 전쟁의 목표였던 이집트 태수 직위의 세습이라는 목표는 달성하는데 성공했을 뿐, 그 외에는 얻은 것이 없었다. 이후 이집트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오스만 제국의 속령이긴 하지만 사실상 오스만 제국에서 분리 독립하게 된다. 메흐메트 알리와 그의 후손들은 1956년까지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으며 이집트의 왕은 아니고 태수(Khediv)라는 칭호를 사용했지만 사실상 한 나라의 독립 군주나 다름없었다. 다만 이집트는 이후로도 여전히 오스만 제국에게 정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했으며, 1860년대까지 오스만 제국 전 속령 중 가장 세입이 높은 지역이 남동 유럽 다음으로 이집트였을 정도였다. 이집트는 영국의 보호령으로 전락한 1880년대에 오스만 제국에게 세금 납부를 중단하였으며 이는 오스만 제국의 세수를 감소시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알리는 1848년 장남 이브라힘 파샤에게 태수 자리를 양위했으나 이브라힘 파샤가 결핵에 걸려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고 차남 투순 파샤의 아들인 손자 압바스 파샤에게 태수 자리가 돌아갔다. 그리고 메흐메트 알리는 1849년 8월 2일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망하여 시신은 카이로의 무함마드 알리 모스크에 안장되었다. 이러한 메흐메트 알리의 생애에 대해 이집트의 경제학자 아민은 강력한 독립국가와 근대화를 달성하고 외세의 압박에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일 가말 압델 나세르(Gamal Abdel Nasser, 1918~1970)의 생애와 공통된 점이 있다고 호평했다. 메흐메트 알리가 이끄는 군사적인 연전연승은 맘루크 왕조의 명군 바이바르스에 필적된다고 평가받기도 했다. 레바논의 역사가 필립. K. 히티(Philip Kindred Hyti)가 주장하기를 19세기 이집트의 역사는 메흐메트 알리의 이야기라고 할 정도 그 위대함을 평가하기도 했다. 알리는 프랑스의 교육 제도를 본받아 의무 교육을 실시했고 군제, 세제, 행정, 통상, 농업,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많은 개혁을 실시해 이집트를 근대화시켰다. 메흐메트 알리 그 자신도 청결을 중시하고 검소하며, 인품이 좋아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후일 이집트 왕국을 전복시키고 공화국으로 만든 압델 나세르조차도 알리는 높게 평가했으며, 메흐메트 알리는 현재도 이집트에서 근대화 되기 전, 마지막 불꽃이라는 역사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메흐메트 알리는 이집트의 역사를 떠나 객관적인 평가로 볼 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경쟁과 중동 특유의 가문 및 혈족 중심 지배 체제의 기원, 그리고 중동 근대화 과정의 시조로 볼 수 있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
-
- 칼럼
- Nova Topos
-
제국주의 집단 서방에 저항한 이집트의 마지막 불꽃 메흐메트 알리 파샤(Mehmet Ali Pasha, 1769~1849) 이야기 - 후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