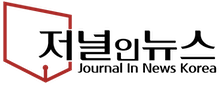칼럼Home > 칼럼
-
프랑스 연금 개혁안 반대 시위에 대한 단상
요즘 프랑스 파리는 연금 개혁안 때문에 2~3월 보통 난리가 아니다.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크롱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 법안이 성립 직전까지 왔다고 한다. 야당이 제출한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 불신임안은 모두 부결되었지만 정부가 하원 표결을 불신임하는 헌법 특별조항(49조 8항)을 발동하는 강경책까지 사용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풍파가 예상되고 있다. 당시 프랑스 하원에서 야당이 17일에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안은 의회를 통과하는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물론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내각이 총사퇴해야 했지만,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셈이다. 다만, 헌법위원회의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지만 법안의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할 권한이 있다해도 대체로 승인하는 편이기 때문에 연금개혁안 또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헌법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마린 르펜 등이 헌법위원회 검토를 요구 중에 엤다. 2022년 마크롱이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임명한 보른 총리는 하원 표결을 건너 뛰는 헌법 특별조항을 소환한 것이 것이 이번이 총 11번째의 일이다. 물론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정부가 의회를 건너 뛰고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전체 국민들의 지지와 야당의 지지까지 받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현재 여소야대 구도에서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혁을 지지한 우파 공화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당과 치열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향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의회가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게 되면 시간은 물론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여 원활한 국정 운영은 쉽지 않다. 이에 극좌 성향을 가진 마틸데 파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당" 의원은 정부를 붕괴시키고 개혁을 중단시키기 위해 단 9표가 부족했다. 프랑스인들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을 대변할 정부는 이미 죽었고 더는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올해 1월 10일에 발표한 한 이후인 지난 1월 19일부터 두 달 동안 8차례 전국적인 단위로 시위 및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된 20일에는 프랑스 각지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오면서 양상은 더욱 심각하게 변해갔다. 여기에 환경 미화 노동자들이 파업해 쓰레기가 거리에 쌓여 있으며 시위 때 쓰레기통에 불이 붙어 불 타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 노조는 23일에도 전국 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과잉 진압으로 현재 논란이 심화되는 중이다.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20일 표결이 끝난 뒤에도 시위가 잦아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프랑스 앞에 깊은 불확실성 시기가 놓여 있고 침묵을 지키는 마크롱 대통령이 어떻게 권위를 재확인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여론도 사실 좋지 않은 편이다. 여론 조사 기관인 엘라브가 18~19일 18살 이상 프랑스인 1,1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과반인 69%가 정부가 하원 투표를 건너 뛰고 법안 통과를 시도하는 것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개혁 법안 최종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가정할 때 정년은 2030년까지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늘어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2027년까지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64세에 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43년 동안 노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67세까지 일해야 한다. 노동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선이 최저 임금의 85%로 10% 올라간다. 다만, 취업을 일찍한 경우 조기퇴직이 가능하다. 워킹맘에게는 최대 5% 연금 보너스가 지급되는 절충안을 만들었지만 그게 현실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
프랑스 절대왕정의 신분체제이자 유럽 중근세 시대의 봉건제를 대표하는 이름, 앙시엥 레짐(Ancien Régime) 이야기
앙시엥 레짐(Ancien Régime)은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기 이전의 프랑스 왕국의 국가 체제를 통칭하는 단어로 나타난다. 앙시엥 레짐(Ancien Régime)은 프랑스어로 ‘옛 체제’를 뜻하고 있다. 그러나 앙시앵 레짐을 단순히 중세 유럽에 유행했던 봉건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은 오랫동안 봉건제 아래에서 왕권과 귀족권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그러한 대립의 결과가 관습법과 성문법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형성되어진 사회구조를 통칭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1789년 혁명을 거치면서 앙시앵 레짐의 모든 것을 부정하였으며 의회 중심의 국가로 재편되면서 민주주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왕정복고(The Restoration)'가 이루어지고 대혁명 당시에 이루어졌던 '제도 개선(System improvement)'은 점차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는 당시 부르주아에서 신흥귀족으로 변모한 자들이 프랑스에서 돈과 권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고 이와 같이 축적된 힘이 혁명을 무위로 돌아가게 했던 이유가 됐다. 앙시엥 레짐을 신분제도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왕과 왕의 가족 아래에 크게 3개의 신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왕을 정점으로 하는 이 신분제는 내부를 들여다 보면 신분끼리 완전히 이해관계가 일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서 크게 알려진 것은 특권층 신분과 피지배층 신분의 갈등이라는 구도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다. 앙시앵 레짐의 특권층이 전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특권층들부터가 분열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 프랑스 내에서도 특권 폐지 외에 귀족과 성직자 계급의 전면적인 숙청에는 반대하는 주장들이 상당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자코뱅 당이 몰락한 이유가 이러한 부분인데 정작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 1758~1794) 본인은 이런 숙청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다수의 특권층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일례로 20세기 프랑스 공화국의 과학자로 알려진 루이 드 브로이(Louis de Broglie, 1892~1987)는 공작 작위를 갖고 있었으며 특권만 없었을 뿐이지 재산도 매우 많았고, 귀족 작위 및 칭호도 허가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이러한 특권 폐지 외에 귀족과 성직자 계급의 전면적인 숙청에는 반대하는 자들은 주로 내세울 것이 없는 하급 귀족이나 시골 혹은 소도시 성당의 하위 성직자들이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평민 취급을 받아 특권을 가질 만한 것이 없었던 데다 갈수록 상층부가 견고해지면서 오히려 특권이 없어지는 것이 쉽게 출세를 하는 발판인 상황이 되다 보니 대체로 혁명에 협조적이었다. 후일 프랑스 황제가 되는 나폴레옹은 지중해 코르시카 섬의 이탈리아계 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을 바탕으로 한 절대왕정은 루이 14세 때 전성기를 누렸으나, 루이 15세, 루이 16세를 거치면서 점점 허울만 남은 상태로 변해갔다. 근본적으로는 재정 악화로 인해 프랑스 왕가의 절대적인 세력이 약화된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루이 16세가 즉위하기도 전에 프랑스의 절반에 해당되는 지역의 징세권은 세리들에게 넘어가 있었고 왕권은 상당부분 약화된 상태였다. 이에 대한 일례로 태양왕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귀족들을 순화하는 장소'로 사용했지만, 루이 16세 시대에는 오히려 '귀족들이 권력을 논하는 장소'로 변화했으며, 루이 14세가 사망하자마자 그의 사법권을 충실히 집행했던 파리 고등법원과 기타 여러 지방 법원들은 다시 귀족들의 세력 하에 들어왔다. 1789년 혁명 전야 때는 절대왕정 자체가 이미 이름 뿐인 개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루이 16세 또한 나라를 변혁할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부르봉 왕조가 루이 16세를 중심으로 단합하지 못하고, 왕가의 주요 인물들이 서로 간의 권력과 부의 욕심으로 인해 분열해 있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프랑스 왕실의 힘이 더욱 약화되었다. 혁명 이후, 왕정이 복고되었을 때 루이 18세와 샤를 10세는 은근히 절대왕정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었으며, 루이 13세의 자손으로 왕가의 인척인 오를레앙 공은 이전부터 왕위를 노리고 왕가의 권위를 낮추는 반(反) 왕실 활동을 후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을 지원하여 왕정을 전복시키는데 크게 일조했다. 이런 부르봉 가문과 오를레앙 가문의 대립은 무려 프랑스 제3공화국 수립에도 도움을 주었을 정도로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이어지면서 프랑스 상류층의 대표적인 라이벌로 자리잡게 되었다. 앙시엥 레짐의 제1계층은 성직자와 수도자 계층으로 약 13만 명에 달했다. 대체로 프랑스 국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카톨릭이라는 종교적 특성상 교황의 신하라는 이중적인 면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교황이 중세 시대와는 달리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프랑스 국왕의 신하나 다름 없었다. 이러한 제1계층의 숫자는 당시 프랑스 전 국민의 0.8%~1% 미만에 불과했지만 경작 가능 토지의 10%를 차지하고 있었고, 교회의 십일조와 수도원의 토지까지 합쳐서 여러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면세 계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단한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제1계층 모두가 기득권층은 아니었고 일선에 있는 성직자들과 고위 성직자, 그리고 고위 성직자 중에서도 상황에 따라 재물 축적 및 정계 및 군대에 진출함에 따라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도 했다. 물론 고위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하위 성직자 및 수도자들끼리도 계층이 갈려 대주교와 주교, 수도원장이나 수녀원장과 같은 고위급 성직자 및 수도자들은 귀족 가문에서 주로 충당되었고, 주요 직위들도 귀족 출신이 독점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프랑스 내의 큰 성당들과 수도원이 귀족 출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혜택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위 성직자들은 귀족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지방의 작은 본당이나 시골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당시에 농민 및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현실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고 있었고, 신분도 귀족과 먼 계층들이 많았다. 따라서 교회의 자금도 일괄적으로 거두어가서 재분배하는 형태였는데, 최소 단위 교구나 본당에는 자금이 내려오지 않은 데다 내려오더라도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접촉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위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고위 성직자 및 수도자들과 철저히 이해관계가 달랐다. 실제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였지만, 이 당시에는 프랑스 교회가 교황이 있는 로마 교회에 완전히 종속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갈리아 교회주의가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프랑스에서 이단심문은 자주 나타나는 행사가 아니었으며 교황이 내린 결정 사항도 우선적으로 프랑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적용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종교적 통제를 지지한 루이 14세는 어디까지나 프랑스 교회를 자신이 더 통제하기를 원했을 뿐, 프랑스 카톨릭의 분립을 원하지 않았다. 실제로 프랑스는 로마 이단 심문관의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독자적인 종교재판소를 소유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교황도 가장 강력하면서 신앙심이 깊은 카톨릭교도의 국왕들은 필수적으로 가까이 해야만 하는 강력한 동맹이었기 때문에 이는 암묵적으로 유지되기도 했다. 이전에는 스페인 국왕이 가장 강력하면서 신앙심이 깊은 카톨릭 군주로서 교황을 지켜주는 우방의 역할을 했지만 루이 14세의 집권 이후 프랑스가 스페인을 뛰어넘어 유럽의 최강국이 되면서 스페인 국왕이 하던 역할을 프랑스 국왕이 대신 하게 되었다. 심지어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루이 14세의 둘째 손자였던 필리프가 스페인의 왕이 되었고 필리프의 아들들은 스페인 뿐만 아니라 교황령 남부의 시칠리아 왕국과 나폴리 왕국의 왕까지 되었기 때문에 교황은 더더욱 프랑스의 왕을 멀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갈리아 교회주의는 종교에 관심 없던 나폴레옹이 집권하게 되면서 대부분 붕괴되었다.
-
Generation Z: Navigating a New World
Previous generations reveled in tales of their student years, reliving love stories that didn't go as planned, laughing about regrettable tattoos, and reminiscing about late-night adventures that defined their youth. But what will Generation Z, born into a world of unprecedented challenges and rapid technological change, remember from these formal years. Stephen Bartlett, a 31-year-old British entrepreneur and podcaster, shares a poignant reflection on his Gen Z experience. His student years were overshadowed by the coronavirus pandemic, which confined him to his room, turned university meals into solitary events, and transformed short walks into the highlight of his social life. For many in Generation Z, crucial milestones such as their student years and the brief window of carefree living before entering the workforce were marked by isolation and disruption. One might assume that these hardships forged a generation of hyper-resilient individuals ready to tackle the world's challenges. However, Bartlett argues that this isn't necessarily the case. In a recent article in The Economist, Generation Z is described as the “least resilient” generation. Bartlett echoes this sentiment, noting that he and his peers are often viewed as sensitive, socially awkward, and prone to hiding behind screens. Critics suggest that frequent job changes, absenteeism, and mental health issues are now common among Gen Z, attributing these trends to a deeper malaise. The Struggles and Criticisms of Gen Z Bartlett paints a somber picture of his generation, describing how many struggle to integrate into the adult world. The intense focus on academic success often leaves them ill-prepared for real-world problem-solving and critical thinking. The emphasis on university education saddles many with debt for degrees that may not align with their career paths, discouraging risk-taking and unconventional career choices. Moreover, Bartlett points out that Gen Z is often uncomfortable with discomfort. Raised in a culture that tends to invalidate differing viewpoints, many lack exposure to healthy dialogue, which is essential for developing resilience and the ability to respectfully disagree. Moreover, Bartlett points out that Gen Z is often uncomfortable with discomfort. Raised in a culture that tends to invalidate differing viewpoints, many lack exposure to healthy dialogue, which is essential for developing resilience and the ability to respectfully disagree. The heightened focus on mental health, while important, can sometimes create a sense of fragility. Bartlett acknowledges that mental health awareness is crucial, but he warns that the constant analysis of emotions can lead to an overwhelming sense of vulnerability. The perpetual engagement with social media exacerbates this issue, fostering a desire for instant gratification and eroding attention spans. This constant digital presence has real-world implications. For instance, job applications have become gamified, which can diminish the seriousness with which they are approached. This shift affects work culture, reducing the ability to persist through challenging tasks or endure less satisfying roles. Adapting to Modern Challenges The result, Bartlett argues, is a generation unaccustomed to discomfort, lacking perseverance, and unprepared for life's inevitable challenges. Adding to this is an ongoing anti-establishment sentiment that portrays society as fundamentally flawed and oppressive. Social media and around-the-clock influencers distort perceptions of reality, exacerbating these feelings. Fifty years ago, generational divides were defined by differences in culture, music, and fashion. Today, technology and a paradoxical overload of information have deepened these divides, altering how we live, think, and interact. In this landscape, truth has become subjective, and independent thought seems restricted. Society appears more divided and uncivilized, with individuals increasingly distant from one another, avoiding meaningful interactions. Yet, there is hope. If Generation Z can cultivate the resilience and determination necessary for modern life, they may navigate these challenges successfully. Embracing discomfort, fostering critical thinking, and learning to engage constructively with differing viewpoints will be crucial. By doing so, perhaps we can ensure that the next generation will have a brighter, more connected future to look forward to, with stories of resilience and triumph to tell.
-
Mystery of the Pyramids Unveiled: The Hidden River of the Sahara
The Enigma of the Pyramids' Location Discovery of the Lost River The Role of the Ahramat River Unearthing the Past The River's Disappearance A New Chapter in Egyptology
-
조지아가 주목한 트란스니스트리아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정식 국명으로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이다. 이 뜻은 드네스트르 강 건너의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로 불린다. 이 국가는 동유럽에 있는 미승인국으로 1991년부터 사실상 독립 상태에 있으며 독립국가임을 자칭하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특수군사작전을 감행하면서 몰도바 역시 국내 사정이 우크라이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있다. 특히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안보 회의 중 몰도바를 침공하려는 계획이 담긴 듯한 지도를 공개하여 논란이 커졌다. 따라서 몰도바의 대통령 마이아 산두는 몰도바를 루마니아에 병합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면서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위기를 겪게 된다. 몰도바와 루마니아는 사실상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9세기 초반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속국이었던 몰다비아 공국의 동쪽 절반이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으로 할양되면서 서로 다른 나라가 된 것으로 보인다. 몰도바를 루마니아에 병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여 위기감이 고조된 것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근처인 드네스트르 강 동쪽에 사는 러시아-슬라브계 주민들이었다. 특히 몰도바인들도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은 러시아어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동참했다. 2021년의 대선에서는 현 대통령인 바딤 크라스노셀스키(Вадим Красносельский)와 다른 무소속 후보인 세르게이 핀자르(Сергей Пынзарь) 후보 단 두 후보만 나섰다.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35.3%의 낮은 투표율이 나왔으나 25%는 넘기면서 유효한 대선으로 인정이 되었다. 현 대통령인 크라스노셀스키 대통령이 75%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하며 2선에 성공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세가 불안정한 국가인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는 입장을 표명하는데 반해 국방부는 러시아에 대해 과도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이 러시아의 계획과 달리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자 러시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 국방부로 하여금 가짜 깃발 작전을 벌여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주둔한 러시아군을 동원하기도 했다. 현재 트란스니스트리아에는 약 1,500명의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자치의회는 지난 28일 특별회의를 열고 22만 명의 러시아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몰도바의 점증하는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합병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월 몰도바 정부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과의 거래에 관세를 도입하며 경제적 압박을 가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중에 트란스니스트리아와의 국경을 봉쇄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이 지역으로 가는 송유관도 막았다. 이에 따라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사실상 몰도바 뿐이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가 교역품에 과세하면 트란스니스트리아 GDP의 10%에 이르는 비용이 더 생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러시아와 합병론이 부상하자 가장 긴장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조지아다. 조지아는 압하지야 자치공화국과 남오세티아 자치공화국이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 또한 러시아계 주민이 80% 이상 되는 미승인 자치공화국이며 러시아와 이미 두 차례 남오세티아 전쟁을 벌인 바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러시아와 합병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압하지야와 남오세이타에 미칠 것이며이 자치공화국들 또한 러시아와 합병론을 주장하게 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조지아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에 대한 영유권과 영토주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돈바스처럼 러시아에 합병되기라도 한다면 조지아의 영토는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터키와 러시아의 압박을 받아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놓이기 때문이다. 최근 조지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예의주시하며 보고 있다. 그만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 더욱 그러하다.
-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가 분리된 이유 (下편)
코소보 전쟁 이후, 유고슬라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정권이 실각하면서 주카노비치는 세르비아와의 분리독립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세르비아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마르크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주카노비치는 이 때부터 집단 서방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 주카노비치는 독일에게 내주면 안 될 것을 내주게 된다. 이는 몬테네그로의 확실한 수입원인 관광 산업이었다. 헤르체그 노비, 코토르, 티바트, 부드바와 같은 아드리아 해안가의 도시들은 예로부터 휴양도시로 유명했다. 실제로 사회주의 시기부터 여름 휴양지로 유명했었는데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었던 요시프 티토의 휴양지도 몬테네그로에 존재했을 정도였다. 워낙 몬테네그로의 경제력이 처참했던 탓에 독일의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국가 경제를 유지하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베오그라드 연방 정부에 새로운 지원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기에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두 개의 연방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몬테네그로는 경제적인 독립화를 선언했다. 이 때 독일과 프랑스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몬테네그로에 유입되었고 두 국가의 검은 돈, 탈세의 창구로 이용되기 시작한다. 현재 유럽에서 몰타와 키프로스가 갖고 있었던 탈세 창구의 위치를 90년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 몬테네그로가 갖고 있었던 셈이다. 연방 내 경제적 독립에 성공한 주카노비치는 이내 정치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계획하게 된다. 특히 독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몬테네그로 사회민주당(Социјалдемократска партија Црне Горе)은 주카노비치가 당수로 활동하면서 해안가 4개 도시인 헤르체그 노비, 코토르, 티바트, 부드바의 개혁파들을 중심으로 독일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으며 몬테네그로 정국을 주도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 보이슬라브 코슈투니차(Војислав Коштуница)는 연방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몬테네그로의 정치적 독립을 반대했다. 그러나 독일과 집단 서방, 미국은 주카노비치와 몬테네그로 사민당을 적극 지지하며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구성된 신(新)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할하기에 나선다. 한편 신 유고 연방은 밀로셰비치가 물러나게 되면서 몬테네그로 독립에 대해 세르비아 사회는 오히려 반대하는 모양새에 들어갔고, 잘못하면 몬테네그로 국민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리자 사민당은 독일 및,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독립을 잠시 유보하고 세르비아 공화국과 타협해 세르비아와 국가 연합을 구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베오그라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3년에 유고슬라비아는 헌법을 개정하였고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 연합'으로 국호를 바꾸게 된다. 당시 부총리에 재직했던 자르코 라크체비치(Жарко Ракчевић)는 세르비아와 연합을 반대했던 인물이지만 베오그라드 협정이 체결되자 스스로 부총리 직위를 사임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외교적 노선은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세르비아는 친러 성향으로 친러를 고수하고 몬테네그로는 친서방주의를 고수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독일의 지원을 받은 몬테네그로는 코소보 전쟁에서 파괴된 세르비아보다 경제력에서 훨씬 우월한 상태였고 세르비아는 전후복구를 몬테네그로가 받은 서방의 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몬테네그로 내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하기 직전까지 몰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내 정정마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몬테네그로는 독일 및집단 서방과의 협상을 통해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독립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결정하게 된다. 대신 집단 서방은 주카노비치에게 최소 찬성의 55%는 넘겨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고 마침내 2006년 5월 21일에 헌법에 따라 몬테네그로에서는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시행되었다. 이 투표에서 몬테네그로는 55.5%의 찬성을 얻었고 결국 미국과 집단 서방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마침내 몬테네그로는 세르비아와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헌법은 무효화 되었으며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고 주카노비치의 총리 지위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에 대해 세르비아 내에서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약속한 대로 세르비아에서도 몬테네그로의 독립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자치공화국으로서의 헌법을 독립국 헌법으로 개정하여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이로써 유고슬라비아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신(新) 유고슬라비아가 해체 된 것은 사실상 그 배경에는 집단 서방이 있었고 독일이 그 배후에 있었다. 게다가 신 유고 연방 내 악화된 경제 상황은 두 나라의 분리로 이어졌다. 주카노비치는 헬무트 콜-게르하르트 슈뢰더-앙겔라 메르켈로 이어지는 독일 정계와 친분을 유지했고 몬테네그로 독립에 최종적으로 싸인한 인물 또한 당시 신임 총리였던 메르켈이었다. 결국 유고슬라비아를 분할해서 쪼개는데 성공한 집단 서방은 2008년 코소보도 분할하는데 성공하여 세르비아는 국가 생존마저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맞이한다. 그러나 세르비아의 배경에는 여전히 러시아가 있었고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세르비아는 진작에서 멸망하고 남았을 국가였다.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는 상호 간에 주권국가로 갈라서게 되었지만 그 외에 모든 부분은 상호 협력하고 있다.
-
-
프랑스 연금 개혁안 반대 시위에 대한 단상
- 요즘 프랑스 파리는 연금 개혁안 때문에 2~3월 보통 난리가 아니다.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크롱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 법안이 성립 직전까지 왔다고 한다. 야당이 제출한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 불신임안은 모두 부결되었지만 정부가 하원 표결을 불신임하는 헌법 특별조항(49조 8항)을 발동하는 강경책까지 사용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풍파가 예상되고 있다. 당시 프랑스 하원에서 야당이 17일에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안은 의회를 통과하는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물론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내각이 총사퇴해야 했지만,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셈이다. 다만, 헌법위원회의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지만 법안의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할 권한이 있다해도 대체로 승인하는 편이기 때문에 연금개혁안 또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헌법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마린 르펜 등이 헌법위원회 검토를 요구 중에 엤다. 2022년 마크롱이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임명한 보른 총리는 하원 표결을 건너 뛰는 헌법 특별조항을 소환한 것이 것이 이번이 총 11번째의 일이다. 물론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정부가 의회를 건너 뛰고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전체 국민들의 지지와 야당의 지지까지 받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현재 여소야대 구도에서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혁을 지지한 우파 공화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당과 치열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향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의회가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게 되면 시간은 물론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여 원활한 국정 운영은 쉽지 않다. 이에 극좌 성향을 가진 마틸데 파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당" 의원은 정부를 붕괴시키고 개혁을 중단시키기 위해 단 9표가 부족했다. 프랑스인들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을 대변할 정부는 이미 죽었고 더는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올해 1월 10일에 발표한 한 이후인 지난 1월 19일부터 두 달 동안 8차례 전국적인 단위로 시위 및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된 20일에는 프랑스 각지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오면서 양상은 더욱 심각하게 변해갔다. 여기에 환경 미화 노동자들이 파업해 쓰레기가 거리에 쌓여 있으며 시위 때 쓰레기통에 불이 붙어 불 타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 노조는 23일에도 전국 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과잉 진압으로 현재 논란이 심화되는 중이다.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20일 표결이 끝난 뒤에도 시위가 잦아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프랑스 앞에 깊은 불확실성 시기가 놓여 있고 침묵을 지키는 마크롱 대통령이 어떻게 권위를 재확인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여론도 사실 좋지 않은 편이다. 여론 조사 기관인 엘라브가 18~19일 18살 이상 프랑스인 1,1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과반인 69%가 정부가 하원 투표를 건너 뛰고 법안 통과를 시도하는 것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개혁 법안 최종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가정할 때 정년은 2030년까지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늘어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2027년까지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64세에 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43년 동안 노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67세까지 일해야 한다. 노동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선이 최저 임금의 85%로 10% 올라간다. 다만, 취업을 일찍한 경우 조기퇴직이 가능하다. 워킹맘에게는 최대 5% 연금 보너스가 지급되는 절충안을 만들었지만 그게 현실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
- 칼럼
- Nova Topos
-
프랑스 연금 개혁안 반대 시위에 대한 단상
-
-
프랑스 절대왕정의 신분체제이자 유럽 중근세 시대의 봉건제를 대표하는 이름, 앙시엥 레짐(Ancien Régime) 이야기
- 앙시엥 레짐(Ancien Régime)은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기 이전의 프랑스 왕국의 국가 체제를 통칭하는 단어로 나타난다. 앙시엥 레짐(Ancien Régime)은 프랑스어로 ‘옛 체제’를 뜻하고 있다. 그러나 앙시앵 레짐을 단순히 중세 유럽에 유행했던 봉건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은 오랫동안 봉건제 아래에서 왕권과 귀족권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그러한 대립의 결과가 관습법과 성문법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형성되어진 사회구조를 통칭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1789년 혁명을 거치면서 앙시앵 레짐의 모든 것을 부정하였으며 의회 중심의 국가로 재편되면서 민주주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왕정복고(The Restoration)'가 이루어지고 대혁명 당시에 이루어졌던 '제도 개선(System improvement)'은 점차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는 당시 부르주아에서 신흥귀족으로 변모한 자들이 프랑스에서 돈과 권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고 이와 같이 축적된 힘이 혁명을 무위로 돌아가게 했던 이유가 됐다. 앙시엥 레짐을 신분제도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왕과 왕의 가족 아래에 크게 3개의 신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왕을 정점으로 하는 이 신분제는 내부를 들여다 보면 신분끼리 완전히 이해관계가 일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서 크게 알려진 것은 특권층 신분과 피지배층 신분의 갈등이라는 구도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다. 앙시앵 레짐의 특권층이 전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특권층들부터가 분열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 프랑스 내에서도 특권 폐지 외에 귀족과 성직자 계급의 전면적인 숙청에는 반대하는 주장들이 상당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자코뱅 당이 몰락한 이유가 이러한 부분인데 정작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 1758~1794) 본인은 이런 숙청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다수의 특권층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일례로 20세기 프랑스 공화국의 과학자로 알려진 루이 드 브로이(Louis de Broglie, 1892~1987)는 공작 작위를 갖고 있었으며 특권만 없었을 뿐이지 재산도 매우 많았고, 귀족 작위 및 칭호도 허가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이러한 특권 폐지 외에 귀족과 성직자 계급의 전면적인 숙청에는 반대하는 자들은 주로 내세울 것이 없는 하급 귀족이나 시골 혹은 소도시 성당의 하위 성직자들이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평민 취급을 받아 특권을 가질 만한 것이 없었던 데다 갈수록 상층부가 견고해지면서 오히려 특권이 없어지는 것이 쉽게 출세를 하는 발판인 상황이 되다 보니 대체로 혁명에 협조적이었다. 후일 프랑스 황제가 되는 나폴레옹은 지중해 코르시카 섬의 이탈리아계 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을 바탕으로 한 절대왕정은 루이 14세 때 전성기를 누렸으나, 루이 15세, 루이 16세를 거치면서 점점 허울만 남은 상태로 변해갔다. 근본적으로는 재정 악화로 인해 프랑스 왕가의 절대적인 세력이 약화된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루이 16세가 즉위하기도 전에 프랑스의 절반에 해당되는 지역의 징세권은 세리들에게 넘어가 있었고 왕권은 상당부분 약화된 상태였다. 이에 대한 일례로 태양왕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귀족들을 순화하는 장소'로 사용했지만, 루이 16세 시대에는 오히려 '귀족들이 권력을 논하는 장소'로 변화했으며, 루이 14세가 사망하자마자 그의 사법권을 충실히 집행했던 파리 고등법원과 기타 여러 지방 법원들은 다시 귀족들의 세력 하에 들어왔다. 1789년 혁명 전야 때는 절대왕정 자체가 이미 이름 뿐인 개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루이 16세 또한 나라를 변혁할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부르봉 왕조가 루이 16세를 중심으로 단합하지 못하고, 왕가의 주요 인물들이 서로 간의 권력과 부의 욕심으로 인해 분열해 있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프랑스 왕실의 힘이 더욱 약화되었다. 혁명 이후, 왕정이 복고되었을 때 루이 18세와 샤를 10세는 은근히 절대왕정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었으며, 루이 13세의 자손으로 왕가의 인척인 오를레앙 공은 이전부터 왕위를 노리고 왕가의 권위를 낮추는 반(反) 왕실 활동을 후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을 지원하여 왕정을 전복시키는데 크게 일조했다. 이런 부르봉 가문과 오를레앙 가문의 대립은 무려 프랑스 제3공화국 수립에도 도움을 주었을 정도로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이어지면서 프랑스 상류층의 대표적인 라이벌로 자리잡게 되었다. 앙시엥 레짐의 제1계층은 성직자와 수도자 계층으로 약 13만 명에 달했다. 대체로 프랑스 국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카톨릭이라는 종교적 특성상 교황의 신하라는 이중적인 면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교황이 중세 시대와는 달리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프랑스 국왕의 신하나 다름 없었다. 이러한 제1계층의 숫자는 당시 프랑스 전 국민의 0.8%~1% 미만에 불과했지만 경작 가능 토지의 10%를 차지하고 있었고, 교회의 십일조와 수도원의 토지까지 합쳐서 여러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면세 계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단한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제1계층 모두가 기득권층은 아니었고 일선에 있는 성직자들과 고위 성직자, 그리고 고위 성직자 중에서도 상황에 따라 재물 축적 및 정계 및 군대에 진출함에 따라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도 했다. 물론 고위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하위 성직자 및 수도자들끼리도 계층이 갈려 대주교와 주교, 수도원장이나 수녀원장과 같은 고위급 성직자 및 수도자들은 귀족 가문에서 주로 충당되었고, 주요 직위들도 귀족 출신이 독점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프랑스 내의 큰 성당들과 수도원이 귀족 출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혜택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위 성직자들은 귀족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지방의 작은 본당이나 시골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당시에 농민 및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현실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고 있었고, 신분도 귀족과 먼 계층들이 많았다. 따라서 교회의 자금도 일괄적으로 거두어가서 재분배하는 형태였는데, 최소 단위 교구나 본당에는 자금이 내려오지 않은 데다 내려오더라도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접촉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위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고위 성직자 및 수도자들과 철저히 이해관계가 달랐다. 실제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였지만, 이 당시에는 프랑스 교회가 교황이 있는 로마 교회에 완전히 종속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갈리아 교회주의가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프랑스에서 이단심문은 자주 나타나는 행사가 아니었으며 교황이 내린 결정 사항도 우선적으로 프랑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적용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종교적 통제를 지지한 루이 14세는 어디까지나 프랑스 교회를 자신이 더 통제하기를 원했을 뿐, 프랑스 카톨릭의 분립을 원하지 않았다. 실제로 프랑스는 로마 이단 심문관의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독자적인 종교재판소를 소유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교황도 가장 강력하면서 신앙심이 깊은 카톨릭교도의 국왕들은 필수적으로 가까이 해야만 하는 강력한 동맹이었기 때문에 이는 암묵적으로 유지되기도 했다. 이전에는 스페인 국왕이 가장 강력하면서 신앙심이 깊은 카톨릭 군주로서 교황을 지켜주는 우방의 역할을 했지만 루이 14세의 집권 이후 프랑스가 스페인을 뛰어넘어 유럽의 최강국이 되면서 스페인 국왕이 하던 역할을 프랑스 국왕이 대신 하게 되었다. 심지어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루이 14세의 둘째 손자였던 필리프가 스페인의 왕이 되었고 필리프의 아들들은 스페인 뿐만 아니라 교황령 남부의 시칠리아 왕국과 나폴리 왕국의 왕까지 되었기 때문에 교황은 더더욱 프랑스의 왕을 멀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갈리아 교회주의는 종교에 관심 없던 나폴레옹이 집권하게 되면서 대부분 붕괴되었다.
-
- 칼럼
- Nova Topos
-
프랑스 절대왕정의 신분체제이자 유럽 중근세 시대의 봉건제를 대표하는 이름, 앙시엥 레짐(Ancien Régime) 이야기
-
-
Generation Z: Navigating a New World
- Previous generations reveled in tales of their student years, reliving love stories that didn't go as planned, laughing about regrettable tattoos, and reminiscing about late-night adventures that defined their youth. But what will Generation Z, born into a world of unprecedented challenges and rapid technological change, remember from these formal years. Stephen Bartlett, a 31-year-old British entrepreneur and podcaster, shares a poignant reflection on his Gen Z experience. His student years were overshadowed by the coronavirus pandemic, which confined him to his room, turned university meals into solitary events, and transformed short walks into the highlight of his social life. For many in Generation Z, crucial milestones such as their student years and the brief window of carefree living before entering the workforce were marked by isolation and disruption. One might assume that these hardships forged a generation of hyper-resilient individuals ready to tackle the world's challenges. However, Bartlett argues that this isn't necessarily the case. In a recent article in The Economist, Generation Z is described as the “least resilient” generation. Bartlett echoes this sentiment, noting that he and his peers are often viewed as sensitive, socially awkward, and prone to hiding behind screens. Critics suggest that frequent job changes, absenteeism, and mental health issues are now common among Gen Z, attributing these trends to a deeper malaise. The Struggles and Criticisms of Gen Z Bartlett paints a somber picture of his generation, describing how many struggle to integrate into the adult world. The intense focus on academic success often leaves them ill-prepared for real-world problem-solving and critical thinking. The emphasis on university education saddles many with debt for degrees that may not align with their career paths, discouraging risk-taking and unconventional career choices. Moreover, Bartlett points out that Gen Z is often uncomfortable with discomfort. Raised in a culture that tends to invalidate differing viewpoints, many lack exposure to healthy dialogue, which is essential for developing resilience and the ability to respectfully disagree. Moreover, Bartlett points out that Gen Z is often uncomfortable with discomfort. Raised in a culture that tends to invalidate differing viewpoints, many lack exposure to healthy dialogue, which is essential for developing resilience and the ability to respectfully disagree. The heightened focus on mental health, while important, can sometimes create a sense of fragility. Bartlett acknowledges that mental health awareness is crucial, but he warns that the constant analysis of emotions can lead to an overwhelming sense of vulnerability. The perpetual engagement with social media exacerbates this issue, fostering a desire for instant gratification and eroding attention spans. This constant digital presence has real-world implications. For instance, job applications have become gamified, which can diminish the seriousness with which they are approached. This shift affects work culture, reducing the ability to persist through challenging tasks or endure less satisfying roles. Adapting to Modern Challenges The result, Bartlett argues, is a generation unaccustomed to discomfort, lacking perseverance, and unprepared for life's inevitable challenges. Adding to this is an ongoing anti-establishment sentiment that portrays society as fundamentally flawed and oppressive. Social media and around-the-clock influencers distort perceptions of reality, exacerbating these feelings. Fifty years ago, generational divides were defined by differences in culture, music, and fashion. Today, technology and a paradoxical overload of information have deepened these divides, altering how we live, think, and interact. In this landscape, truth has become subjective, and independent thought seems restricted. Society appears more divided and uncivilized, with individuals increasingly distant from one another, avoiding meaningful interactions. Yet, there is hope. If Generation Z can cultivate the resilience and determination necessary for modern life, they may navigate these challenges successfully. Embracing discomfort, fostering critical thinking, and learning to engage constructively with differing viewpoints will be crucial. By doing so, perhaps we can ensure that the next generation will have a brighter, more connected future to look forward to, with stories of resilience and triumph to tell.
-
- 칼럼
- Thoughts Of Seraphine
-
Generation Z: Navigating a New World
-
-
Mystery of the Pyramids Unveiled: The Hidden River of the Sahara
- The Enigma of the Pyramids' Location Discovery of the Lost River The Role of the Ahramat River Unearthing the Past The River's Disappearance A New Chapter in Egyptology
-
- 칼럼
- Thoughts Of Seraphine
-
Mystery of the Pyramids Unveiled: The Hidden River of the Sahara
-
-
조지아가 주목한 트란스니스트리아
-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정식 국명으로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이다. 이 뜻은 드네스트르 강 건너의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로 불린다. 이 국가는 동유럽에 있는 미승인국으로 1991년부터 사실상 독립 상태에 있으며 독립국가임을 자칭하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특수군사작전을 감행하면서 몰도바 역시 국내 사정이 우크라이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있다. 특히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안보 회의 중 몰도바를 침공하려는 계획이 담긴 듯한 지도를 공개하여 논란이 커졌다. 따라서 몰도바의 대통령 마이아 산두는 몰도바를 루마니아에 병합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면서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위기를 겪게 된다. 몰도바와 루마니아는 사실상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9세기 초반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속국이었던 몰다비아 공국의 동쪽 절반이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으로 할양되면서 서로 다른 나라가 된 것으로 보인다. 몰도바를 루마니아에 병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여 위기감이 고조된 것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근처인 드네스트르 강 동쪽에 사는 러시아-슬라브계 주민들이었다. 특히 몰도바인들도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은 러시아어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동참했다. 2021년의 대선에서는 현 대통령인 바딤 크라스노셀스키(Вадим Красносельский)와 다른 무소속 후보인 세르게이 핀자르(Сергей Пынзарь) 후보 단 두 후보만 나섰다.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35.3%의 낮은 투표율이 나왔으나 25%는 넘기면서 유효한 대선으로 인정이 되었다. 현 대통령인 크라스노셀스키 대통령이 75%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하며 2선에 성공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세가 불안정한 국가인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는 입장을 표명하는데 반해 국방부는 러시아에 대해 과도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이 러시아의 계획과 달리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자 러시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 국방부로 하여금 가짜 깃발 작전을 벌여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주둔한 러시아군을 동원하기도 했다. 현재 트란스니스트리아에는 약 1,500명의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자치의회는 지난 28일 특별회의를 열고 22만 명의 러시아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몰도바의 점증하는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합병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월 몰도바 정부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과의 거래에 관세를 도입하며 경제적 압박을 가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중에 트란스니스트리아와의 국경을 봉쇄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이 지역으로 가는 송유관도 막았다. 이에 따라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사실상 몰도바 뿐이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가 교역품에 과세하면 트란스니스트리아 GDP의 10%에 이르는 비용이 더 생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러시아와 합병론이 부상하자 가장 긴장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조지아다. 조지아는 압하지야 자치공화국과 남오세티아 자치공화국이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 또한 러시아계 주민이 80% 이상 되는 미승인 자치공화국이며 러시아와 이미 두 차례 남오세티아 전쟁을 벌인 바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러시아와 합병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압하지야와 남오세이타에 미칠 것이며이 자치공화국들 또한 러시아와 합병론을 주장하게 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조지아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에 대한 영유권과 영토주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돈바스처럼 러시아에 합병되기라도 한다면 조지아의 영토는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터키와 러시아의 압박을 받아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놓이기 때문이다. 최근 조지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예의주시하며 보고 있다. 그만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 더욱 그러하다.
-
- 칼럼
- Nova Topos
-
조지아가 주목한 트란스니스트리아
-
-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가 분리된 이유 (下편)
- 코소보 전쟁 이후, 유고슬라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정권이 실각하면서 주카노비치는 세르비아와의 분리독립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세르비아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마르크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주카노비치는 이 때부터 집단 서방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 주카노비치는 독일에게 내주면 안 될 것을 내주게 된다. 이는 몬테네그로의 확실한 수입원인 관광 산업이었다. 헤르체그 노비, 코토르, 티바트, 부드바와 같은 아드리아 해안가의 도시들은 예로부터 휴양도시로 유명했다. 실제로 사회주의 시기부터 여름 휴양지로 유명했었는데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었던 요시프 티토의 휴양지도 몬테네그로에 존재했을 정도였다. 워낙 몬테네그로의 경제력이 처참했던 탓에 독일의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국가 경제를 유지하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베오그라드 연방 정부에 새로운 지원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기에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두 개의 연방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몬테네그로는 경제적인 독립화를 선언했다. 이 때 독일과 프랑스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몬테네그로에 유입되었고 두 국가의 검은 돈, 탈세의 창구로 이용되기 시작한다. 현재 유럽에서 몰타와 키프로스가 갖고 있었던 탈세 창구의 위치를 90년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 몬테네그로가 갖고 있었던 셈이다. 연방 내 경제적 독립에 성공한 주카노비치는 이내 정치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계획하게 된다. 특히 독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몬테네그로 사회민주당(Социјалдемократска партија Црне Горе)은 주카노비치가 당수로 활동하면서 해안가 4개 도시인 헤르체그 노비, 코토르, 티바트, 부드바의 개혁파들을 중심으로 독일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으며 몬테네그로 정국을 주도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 보이슬라브 코슈투니차(Војислав Коштуница)는 연방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몬테네그로의 정치적 독립을 반대했다. 그러나 독일과 집단 서방, 미국은 주카노비치와 몬테네그로 사민당을 적극 지지하며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구성된 신(新)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할하기에 나선다. 한편 신 유고 연방은 밀로셰비치가 물러나게 되면서 몬테네그로 독립에 대해 세르비아 사회는 오히려 반대하는 모양새에 들어갔고, 잘못하면 몬테네그로 국민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리자 사민당은 독일 및,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독립을 잠시 유보하고 세르비아 공화국과 타협해 세르비아와 국가 연합을 구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베오그라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3년에 유고슬라비아는 헌법을 개정하였고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 연합'으로 국호를 바꾸게 된다. 당시 부총리에 재직했던 자르코 라크체비치(Жарко Ракчевић)는 세르비아와 연합을 반대했던 인물이지만 베오그라드 협정이 체결되자 스스로 부총리 직위를 사임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외교적 노선은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세르비아는 친러 성향으로 친러를 고수하고 몬테네그로는 친서방주의를 고수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독일의 지원을 받은 몬테네그로는 코소보 전쟁에서 파괴된 세르비아보다 경제력에서 훨씬 우월한 상태였고 세르비아는 전후복구를 몬테네그로가 받은 서방의 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몬테네그로 내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하기 직전까지 몰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내 정정마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몬테네그로는 독일 및집단 서방과의 협상을 통해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독립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결정하게 된다. 대신 집단 서방은 주카노비치에게 최소 찬성의 55%는 넘겨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고 마침내 2006년 5월 21일에 헌법에 따라 몬테네그로에서는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시행되었다. 이 투표에서 몬테네그로는 55.5%의 찬성을 얻었고 결국 미국과 집단 서방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마침내 몬테네그로는 세르비아와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헌법은 무효화 되었으며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고 주카노비치의 총리 지위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에 대해 세르비아 내에서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약속한 대로 세르비아에서도 몬테네그로의 독립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자치공화국으로서의 헌법을 독립국 헌법으로 개정하여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이로써 유고슬라비아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신(新) 유고슬라비아가 해체 된 것은 사실상 그 배경에는 집단 서방이 있었고 독일이 그 배후에 있었다. 게다가 신 유고 연방 내 악화된 경제 상황은 두 나라의 분리로 이어졌다. 주카노비치는 헬무트 콜-게르하르트 슈뢰더-앙겔라 메르켈로 이어지는 독일 정계와 친분을 유지했고 몬테네그로 독립에 최종적으로 싸인한 인물 또한 당시 신임 총리였던 메르켈이었다. 결국 유고슬라비아를 분할해서 쪼개는데 성공한 집단 서방은 2008년 코소보도 분할하는데 성공하여 세르비아는 국가 생존마저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맞이한다. 그러나 세르비아의 배경에는 여전히 러시아가 있었고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세르비아는 진작에서 멸망하고 남았을 국가였다.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는 상호 간에 주권국가로 갈라서게 되었지만 그 외에 모든 부분은 상호 협력하고 있다.
-
- 칼럼
- Nova Topos
-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가 분리된 이유 (下편)
실시간 칼럼 기사
-
-
프랑스 연금 개혁안 반대 시위에 대한 단상
- 요즘 프랑스 파리는 연금 개혁안 때문에 2~3월 보통 난리가 아니다.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크롱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 법안이 성립 직전까지 왔다고 한다. 야당이 제출한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 불신임안은 모두 부결되었지만 정부가 하원 표결을 불신임하는 헌법 특별조항(49조 8항)을 발동하는 강경책까지 사용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풍파가 예상되고 있다. 당시 프랑스 하원에서 야당이 17일에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안은 의회를 통과하는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물론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내각이 총사퇴해야 했지만,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셈이다. 다만, 헌법위원회의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지만 법안의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할 권한이 있다해도 대체로 승인하는 편이기 때문에 연금개혁안 또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헌법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마린 르펜 등이 헌법위원회 검토를 요구 중에 엤다. 2022년 마크롱이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임명한 보른 총리는 하원 표결을 건너 뛰는 헌법 특별조항을 소환한 것이 것이 이번이 총 11번째의 일이다. 물론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정부가 의회를 건너 뛰고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전체 국민들의 지지와 야당의 지지까지 받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현재 여소야대 구도에서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혁을 지지한 우파 공화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당과 치열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향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의회가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게 되면 시간은 물론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여 원활한 국정 운영은 쉽지 않다. 이에 극좌 성향을 가진 마틸데 파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당" 의원은 정부를 붕괴시키고 개혁을 중단시키기 위해 단 9표가 부족했다. 프랑스인들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을 대변할 정부는 이미 죽었고 더는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올해 1월 10일에 발표한 한 이후인 지난 1월 19일부터 두 달 동안 8차례 전국적인 단위로 시위 및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된 20일에는 프랑스 각지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오면서 양상은 더욱 심각하게 변해갔다. 여기에 환경 미화 노동자들이 파업해 쓰레기가 거리에 쌓여 있으며 시위 때 쓰레기통에 불이 붙어 불 타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 노조는 23일에도 전국 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과잉 진압으로 현재 논란이 심화되는 중이다.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20일 표결이 끝난 뒤에도 시위가 잦아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프랑스 앞에 깊은 불확실성 시기가 놓여 있고 침묵을 지키는 마크롱 대통령이 어떻게 권위를 재확인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여론도 사실 좋지 않은 편이다. 여론 조사 기관인 엘라브가 18~19일 18살 이상 프랑스인 1,1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과반인 69%가 정부가 하원 투표를 건너 뛰고 법안 통과를 시도하는 것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개혁 법안 최종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가정할 때 정년은 2030년까지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늘어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2027년까지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64세에 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43년 동안 노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67세까지 일해야 한다. 노동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선이 최저 임금의 85%로 10% 올라간다. 다만, 취업을 일찍한 경우 조기퇴직이 가능하다. 워킹맘에게는 최대 5% 연금 보너스가 지급되는 절충안을 만들었지만 그게 현실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
- 칼럼
- Nova Topos
-
프랑스 연금 개혁안 반대 시위에 대한 단상
-
-
프랑스 절대왕정의 신분체제이자 유럽 중근세 시대의 봉건제를 대표하는 이름, 앙시엥 레짐(Ancien Régime) 이야기
- 앙시엥 레짐(Ancien Régime)은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기 이전의 프랑스 왕국의 국가 체제를 통칭하는 단어로 나타난다. 앙시엥 레짐(Ancien Régime)은 프랑스어로 ‘옛 체제’를 뜻하고 있다. 그러나 앙시앵 레짐을 단순히 중세 유럽에 유행했던 봉건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은 오랫동안 봉건제 아래에서 왕권과 귀족권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그러한 대립의 결과가 관습법과 성문법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형성되어진 사회구조를 통칭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1789년 혁명을 거치면서 앙시앵 레짐의 모든 것을 부정하였으며 의회 중심의 국가로 재편되면서 민주주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왕정복고(The Restoration)'가 이루어지고 대혁명 당시에 이루어졌던 '제도 개선(System improvement)'은 점차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는 당시 부르주아에서 신흥귀족으로 변모한 자들이 프랑스에서 돈과 권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고 이와 같이 축적된 힘이 혁명을 무위로 돌아가게 했던 이유가 됐다. 앙시엥 레짐을 신분제도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왕과 왕의 가족 아래에 크게 3개의 신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왕을 정점으로 하는 이 신분제는 내부를 들여다 보면 신분끼리 완전히 이해관계가 일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서 크게 알려진 것은 특권층 신분과 피지배층 신분의 갈등이라는 구도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다. 앙시앵 레짐의 특권층이 전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특권층들부터가 분열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 프랑스 내에서도 특권 폐지 외에 귀족과 성직자 계급의 전면적인 숙청에는 반대하는 주장들이 상당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자코뱅 당이 몰락한 이유가 이러한 부분인데 정작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 1758~1794) 본인은 이런 숙청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다수의 특권층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일례로 20세기 프랑스 공화국의 과학자로 알려진 루이 드 브로이(Louis de Broglie, 1892~1987)는 공작 작위를 갖고 있었으며 특권만 없었을 뿐이지 재산도 매우 많았고, 귀족 작위 및 칭호도 허가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이러한 특권 폐지 외에 귀족과 성직자 계급의 전면적인 숙청에는 반대하는 자들은 주로 내세울 것이 없는 하급 귀족이나 시골 혹은 소도시 성당의 하위 성직자들이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평민 취급을 받아 특권을 가질 만한 것이 없었던 데다 갈수록 상층부가 견고해지면서 오히려 특권이 없어지는 것이 쉽게 출세를 하는 발판인 상황이 되다 보니 대체로 혁명에 협조적이었다. 후일 프랑스 황제가 되는 나폴레옹은 지중해 코르시카 섬의 이탈리아계 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을 바탕으로 한 절대왕정은 루이 14세 때 전성기를 누렸으나, 루이 15세, 루이 16세를 거치면서 점점 허울만 남은 상태로 변해갔다. 근본적으로는 재정 악화로 인해 프랑스 왕가의 절대적인 세력이 약화된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루이 16세가 즉위하기도 전에 프랑스의 절반에 해당되는 지역의 징세권은 세리들에게 넘어가 있었고 왕권은 상당부분 약화된 상태였다. 이에 대한 일례로 태양왕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귀족들을 순화하는 장소'로 사용했지만, 루이 16세 시대에는 오히려 '귀족들이 권력을 논하는 장소'로 변화했으며, 루이 14세가 사망하자마자 그의 사법권을 충실히 집행했던 파리 고등법원과 기타 여러 지방 법원들은 다시 귀족들의 세력 하에 들어왔다. 1789년 혁명 전야 때는 절대왕정 자체가 이미 이름 뿐인 개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루이 16세 또한 나라를 변혁할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부르봉 왕조가 루이 16세를 중심으로 단합하지 못하고, 왕가의 주요 인물들이 서로 간의 권력과 부의 욕심으로 인해 분열해 있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프랑스 왕실의 힘이 더욱 약화되었다. 혁명 이후, 왕정이 복고되었을 때 루이 18세와 샤를 10세는 은근히 절대왕정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었으며, 루이 13세의 자손으로 왕가의 인척인 오를레앙 공은 이전부터 왕위를 노리고 왕가의 권위를 낮추는 반(反) 왕실 활동을 후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을 지원하여 왕정을 전복시키는데 크게 일조했다. 이런 부르봉 가문과 오를레앙 가문의 대립은 무려 프랑스 제3공화국 수립에도 도움을 주었을 정도로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이어지면서 프랑스 상류층의 대표적인 라이벌로 자리잡게 되었다. 앙시엥 레짐의 제1계층은 성직자와 수도자 계층으로 약 13만 명에 달했다. 대체로 프랑스 국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카톨릭이라는 종교적 특성상 교황의 신하라는 이중적인 면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교황이 중세 시대와는 달리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프랑스 국왕의 신하나 다름 없었다. 이러한 제1계층의 숫자는 당시 프랑스 전 국민의 0.8%~1% 미만에 불과했지만 경작 가능 토지의 10%를 차지하고 있었고, 교회의 십일조와 수도원의 토지까지 합쳐서 여러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면세 계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단한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제1계층 모두가 기득권층은 아니었고 일선에 있는 성직자들과 고위 성직자, 그리고 고위 성직자 중에서도 상황에 따라 재물 축적 및 정계 및 군대에 진출함에 따라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도 했다. 물론 고위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하위 성직자 및 수도자들끼리도 계층이 갈려 대주교와 주교, 수도원장이나 수녀원장과 같은 고위급 성직자 및 수도자들은 귀족 가문에서 주로 충당되었고, 주요 직위들도 귀족 출신이 독점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프랑스 내의 큰 성당들과 수도원이 귀족 출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혜택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위 성직자들은 귀족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지방의 작은 본당이나 시골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당시에 농민 및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현실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고 있었고, 신분도 귀족과 먼 계층들이 많았다. 따라서 교회의 자금도 일괄적으로 거두어가서 재분배하는 형태였는데, 최소 단위 교구나 본당에는 자금이 내려오지 않은 데다 내려오더라도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접촉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위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고위 성직자 및 수도자들과 철저히 이해관계가 달랐다. 실제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였지만, 이 당시에는 프랑스 교회가 교황이 있는 로마 교회에 완전히 종속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갈리아 교회주의가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프랑스에서 이단심문은 자주 나타나는 행사가 아니었으며 교황이 내린 결정 사항도 우선적으로 프랑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적용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종교적 통제를 지지한 루이 14세는 어디까지나 프랑스 교회를 자신이 더 통제하기를 원했을 뿐, 프랑스 카톨릭의 분립을 원하지 않았다. 실제로 프랑스는 로마 이단 심문관의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독자적인 종교재판소를 소유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교황도 가장 강력하면서 신앙심이 깊은 카톨릭교도의 국왕들은 필수적으로 가까이 해야만 하는 강력한 동맹이었기 때문에 이는 암묵적으로 유지되기도 했다. 이전에는 스페인 국왕이 가장 강력하면서 신앙심이 깊은 카톨릭 군주로서 교황을 지켜주는 우방의 역할을 했지만 루이 14세의 집권 이후 프랑스가 스페인을 뛰어넘어 유럽의 최강국이 되면서 스페인 국왕이 하던 역할을 프랑스 국왕이 대신 하게 되었다. 심지어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루이 14세의 둘째 손자였던 필리프가 스페인의 왕이 되었고 필리프의 아들들은 스페인 뿐만 아니라 교황령 남부의 시칠리아 왕국과 나폴리 왕국의 왕까지 되었기 때문에 교황은 더더욱 프랑스의 왕을 멀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갈리아 교회주의는 종교에 관심 없던 나폴레옹이 집권하게 되면서 대부분 붕괴되었다.
-
- 칼럼
- Nova Topos
-
프랑스 절대왕정의 신분체제이자 유럽 중근세 시대의 봉건제를 대표하는 이름, 앙시엥 레짐(Ancien Régime) 이야기
-
-
Generation Z: Navigating a New World
- Previous generations reveled in tales of their student years, reliving love stories that didn't go as planned, laughing about regrettable tattoos, and reminiscing about late-night adventures that defined their youth. But what will Generation Z, born into a world of unprecedented challenges and rapid technological change, remember from these formal years. Stephen Bartlett, a 31-year-old British entrepreneur and podcaster, shares a poignant reflection on his Gen Z experience. His student years were overshadowed by the coronavirus pandemic, which confined him to his room, turned university meals into solitary events, and transformed short walks into the highlight of his social life. For many in Generation Z, crucial milestones such as their student years and the brief window of carefree living before entering the workforce were marked by isolation and disruption. One might assume that these hardships forged a generation of hyper-resilient individuals ready to tackle the world's challenges. However, Bartlett argues that this isn't necessarily the case. In a recent article in The Economist, Generation Z is described as the “least resilient” generation. Bartlett echoes this sentiment, noting that he and his peers are often viewed as sensitive, socially awkward, and prone to hiding behind screens. Critics suggest that frequent job changes, absenteeism, and mental health issues are now common among Gen Z, attributing these trends to a deeper malaise. The Struggles and Criticisms of Gen Z Bartlett paints a somber picture of his generation, describing how many struggle to integrate into the adult world. The intense focus on academic success often leaves them ill-prepared for real-world problem-solving and critical thinking. The emphasis on university education saddles many with debt for degrees that may not align with their career paths, discouraging risk-taking and unconventional career choices. Moreover, Bartlett points out that Gen Z is often uncomfortable with discomfort. Raised in a culture that tends to invalidate differing viewpoints, many lack exposure to healthy dialogue, which is essential for developing resilience and the ability to respectfully disagree. Moreover, Bartlett points out that Gen Z is often uncomfortable with discomfort. Raised in a culture that tends to invalidate differing viewpoints, many lack exposure to healthy dialogue, which is essential for developing resilience and the ability to respectfully disagree. The heightened focus on mental health, while important, can sometimes create a sense of fragility. Bartlett acknowledges that mental health awareness is crucial, but he warns that the constant analysis of emotions can lead to an overwhelming sense of vulnerability. The perpetual engagement with social media exacerbates this issue, fostering a desire for instant gratification and eroding attention spans. This constant digital presence has real-world implications. For instance, job applications have become gamified, which can diminish the seriousness with which they are approached. This shift affects work culture, reducing the ability to persist through challenging tasks or endure less satisfying roles. Adapting to Modern Challenges The result, Bartlett argues, is a generation unaccustomed to discomfort, lacking perseverance, and unprepared for life's inevitable challenges. Adding to this is an ongoing anti-establishment sentiment that portrays society as fundamentally flawed and oppressive. Social media and around-the-clock influencers distort perceptions of reality, exacerbating these feelings. Fifty years ago, generational divides were defined by differences in culture, music, and fashion. Today, technology and a paradoxical overload of information have deepened these divides, altering how we live, think, and interact. In this landscape, truth has become subjective, and independent thought seems restricted. Society appears more divided and uncivilized, with individuals increasingly distant from one another, avoiding meaningful interactions. Yet, there is hope. If Generation Z can cultivate the resilience and determination necessary for modern life, they may navigate these challenges successfully. Embracing discomfort, fostering critical thinking, and learning to engage constructively with differing viewpoints will be crucial. By doing so, perhaps we can ensure that the next generation will have a brighter, more connected future to look forward to, with stories of resilience and triumph to tell.
-
- 칼럼
- Thoughts Of Seraphine
-
Generation Z: Navigating a New World
-
-
Mystery of the Pyramids Unveiled: The Hidden River of the Sahara
- The Enigma of the Pyramids' Location Discovery of the Lost River The Role of the Ahramat River Unearthing the Past The River's Disappearance A New Chapter in Egyptology
-
- 칼럼
- Thoughts Of Seraphine
-
Mystery of the Pyramids Unveiled: The Hidden River of the Sahara
-
-
조지아가 주목한 트란스니스트리아
-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정식 국명으로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이다. 이 뜻은 드네스트르 강 건너의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로 불린다. 이 국가는 동유럽에 있는 미승인국으로 1991년부터 사실상 독립 상태에 있으며 독립국가임을 자칭하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특수군사작전을 감행하면서 몰도바 역시 국내 사정이 우크라이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있다. 특히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안보 회의 중 몰도바를 침공하려는 계획이 담긴 듯한 지도를 공개하여 논란이 커졌다. 따라서 몰도바의 대통령 마이아 산두는 몰도바를 루마니아에 병합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면서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위기를 겪게 된다. 몰도바와 루마니아는 사실상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9세기 초반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속국이었던 몰다비아 공국의 동쪽 절반이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으로 할양되면서 서로 다른 나라가 된 것으로 보인다. 몰도바를 루마니아에 병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여 위기감이 고조된 것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근처인 드네스트르 강 동쪽에 사는 러시아-슬라브계 주민들이었다. 특히 몰도바인들도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은 러시아어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동참했다. 2021년의 대선에서는 현 대통령인 바딤 크라스노셀스키(Вадим Красносельский)와 다른 무소속 후보인 세르게이 핀자르(Сергей Пынзарь) 후보 단 두 후보만 나섰다.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35.3%의 낮은 투표율이 나왔으나 25%는 넘기면서 유효한 대선으로 인정이 되었다. 현 대통령인 크라스노셀스키 대통령이 75%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하며 2선에 성공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세가 불안정한 국가인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는 입장을 표명하는데 반해 국방부는 러시아에 대해 과도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이 러시아의 계획과 달리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자 러시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 국방부로 하여금 가짜 깃발 작전을 벌여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주둔한 러시아군을 동원하기도 했다. 현재 트란스니스트리아에는 약 1,500명의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자치의회는 지난 28일 특별회의를 열고 22만 명의 러시아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몰도바의 점증하는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합병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월 몰도바 정부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과의 거래에 관세를 도입하며 경제적 압박을 가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중에 트란스니스트리아와의 국경을 봉쇄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이 지역으로 가는 송유관도 막았다. 이에 따라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사실상 몰도바 뿐이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가 교역품에 과세하면 트란스니스트리아 GDP의 10%에 이르는 비용이 더 생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러시아와 합병론이 부상하자 가장 긴장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조지아다. 조지아는 압하지야 자치공화국과 남오세티아 자치공화국이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 또한 러시아계 주민이 80% 이상 되는 미승인 자치공화국이며 러시아와 이미 두 차례 남오세티아 전쟁을 벌인 바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러시아와 합병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압하지야와 남오세이타에 미칠 것이며이 자치공화국들 또한 러시아와 합병론을 주장하게 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조지아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에 대한 영유권과 영토주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돈바스처럼 러시아에 합병되기라도 한다면 조지아의 영토는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터키와 러시아의 압박을 받아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놓이기 때문이다. 최근 조지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예의주시하며 보고 있다. 그만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 더욱 그러하다.
-
- 칼럼
- Nova Topos
-
조지아가 주목한 트란스니스트리아
-
-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가 분리된 이유 (下편)
- 코소보 전쟁 이후, 유고슬라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정권이 실각하면서 주카노비치는 세르비아와의 분리독립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세르비아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마르크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주카노비치는 이 때부터 집단 서방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 주카노비치는 독일에게 내주면 안 될 것을 내주게 된다. 이는 몬테네그로의 확실한 수입원인 관광 산업이었다. 헤르체그 노비, 코토르, 티바트, 부드바와 같은 아드리아 해안가의 도시들은 예로부터 휴양도시로 유명했다. 실제로 사회주의 시기부터 여름 휴양지로 유명했었는데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었던 요시프 티토의 휴양지도 몬테네그로에 존재했을 정도였다. 워낙 몬테네그로의 경제력이 처참했던 탓에 독일의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국가 경제를 유지하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베오그라드 연방 정부에 새로운 지원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기에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두 개의 연방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몬테네그로는 경제적인 독립화를 선언했다. 이 때 독일과 프랑스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몬테네그로에 유입되었고 두 국가의 검은 돈, 탈세의 창구로 이용되기 시작한다. 현재 유럽에서 몰타와 키프로스가 갖고 있었던 탈세 창구의 위치를 90년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 몬테네그로가 갖고 있었던 셈이다. 연방 내 경제적 독립에 성공한 주카노비치는 이내 정치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계획하게 된다. 특히 독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몬테네그로 사회민주당(Социјалдемократска партија Црне Горе)은 주카노비치가 당수로 활동하면서 해안가 4개 도시인 헤르체그 노비, 코토르, 티바트, 부드바의 개혁파들을 중심으로 독일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으며 몬테네그로 정국을 주도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 보이슬라브 코슈투니차(Војислав Коштуница)는 연방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몬테네그로의 정치적 독립을 반대했다. 그러나 독일과 집단 서방, 미국은 주카노비치와 몬테네그로 사민당을 적극 지지하며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구성된 신(新)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할하기에 나선다. 한편 신 유고 연방은 밀로셰비치가 물러나게 되면서 몬테네그로 독립에 대해 세르비아 사회는 오히려 반대하는 모양새에 들어갔고, 잘못하면 몬테네그로 국민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리자 사민당은 독일 및,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독립을 잠시 유보하고 세르비아 공화국과 타협해 세르비아와 국가 연합을 구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베오그라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3년에 유고슬라비아는 헌법을 개정하였고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 연합'으로 국호를 바꾸게 된다. 당시 부총리에 재직했던 자르코 라크체비치(Жарко Ракчевић)는 세르비아와 연합을 반대했던 인물이지만 베오그라드 협정이 체결되자 스스로 부총리 직위를 사임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외교적 노선은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세르비아는 친러 성향으로 친러를 고수하고 몬테네그로는 친서방주의를 고수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독일의 지원을 받은 몬테네그로는 코소보 전쟁에서 파괴된 세르비아보다 경제력에서 훨씬 우월한 상태였고 세르비아는 전후복구를 몬테네그로가 받은 서방의 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몬테네그로 내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하기 직전까지 몰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내 정정마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몬테네그로는 독일 및집단 서방과의 협상을 통해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독립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결정하게 된다. 대신 집단 서방은 주카노비치에게 최소 찬성의 55%는 넘겨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고 마침내 2006년 5월 21일에 헌법에 따라 몬테네그로에서는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시행되었다. 이 투표에서 몬테네그로는 55.5%의 찬성을 얻었고 결국 미국과 집단 서방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마침내 몬테네그로는 세르비아와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헌법은 무효화 되었으며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고 주카노비치의 총리 지위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에 대해 세르비아 내에서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약속한 대로 세르비아에서도 몬테네그로의 독립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자치공화국으로서의 헌법을 독립국 헌법으로 개정하여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이로써 유고슬라비아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신(新) 유고슬라비아가 해체 된 것은 사실상 그 배경에는 집단 서방이 있었고 독일이 그 배후에 있었다. 게다가 신 유고 연방 내 악화된 경제 상황은 두 나라의 분리로 이어졌다. 주카노비치는 헬무트 콜-게르하르트 슈뢰더-앙겔라 메르켈로 이어지는 독일 정계와 친분을 유지했고 몬테네그로 독립에 최종적으로 싸인한 인물 또한 당시 신임 총리였던 메르켈이었다. 결국 유고슬라비아를 분할해서 쪼개는데 성공한 집단 서방은 2008년 코소보도 분할하는데 성공하여 세르비아는 국가 생존마저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맞이한다. 그러나 세르비아의 배경에는 여전히 러시아가 있었고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세르비아는 진작에서 멸망하고 남았을 국가였다.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는 상호 간에 주권국가로 갈라서게 되었지만 그 외에 모든 부분은 상호 협력하고 있다.
-
- 칼럼
- Nova Topos
-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가 분리된 이유 (下편)
-
-
독일의 재무장, 독배가 될 수 있는 이유
- 유럽 최대 경제 강국인 독일의 재무장이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독일 총리가 독일의 재무장을 선언했으며,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달성할 수 있고, 향후 3.5% 정도까지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일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다른 유럽국들은 내심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독일이 재통일할 때, 러시아(그 당시에 구소련연방)는 독일의 육해공군을 합쳐서 37만 병력으로 제한하고, 핵무기의 보유 및 배치를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독일의 재통일을 승인했다. 당시에 동서독을 합치면 90만 병력이 있었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분명히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또 나치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이를 금지할 필요도 분명히 있었다. 러시아의 이러한 조건은 한편으로 독일의 재무장을 금지함으로써, 러시아의 서쪽 지역에 대한 방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동유럽 지역을 완충지대로 활용하려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거기에는 독일의 통일시 구동독지역에 미군의 배치로 인해 나토가 동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나치 독일의 러시아 침공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던 러시아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요구되었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재무장 금지선 준수는 독일이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긴밀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독일이 전범국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유럽의 지도국으로서 위상을 높였음을 뜻한다. 독일은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북부지역, 크로아티아 북부지역, 폴란드 서부지역, 체코의 일부, 그리고 루마니아 일부 지역 등등에도 영향력이 있다. 이것은 독일이 언제든지 민족주의에 대한 향수를 자극해 유럽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재무장은 특히 러시아를 더욱 자극해서 동유럽에서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은 서로 분열되어 국력이 약해지면, 주변국들의 발호로 독일 영토가 전쟁터로 되어 버렸다. 이와 반대로, 독일이 통일되어 국력이 하나로 되었을 때, 주변국을 침략했지만, 결국 연합세력에 의해 스스로 붕괴했다. 독일의 이러한 모순은 사실 균형의 추를 잘 유지해야만 극복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독일의 재무장은 이른바 세력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유럽 각국의 치열한 군비경쟁, 극우 민족주의의 득세, 동유럽에서 민족갈등의 재현 등등을 유발할 수 있다. 독일 총리가 재무장을 선언했지만, 실질적 재무장을 위해서는 현재 독일 연방군의 현대화를 위한 장비개선과 병력 충원 및 디지털 사이버 정보전의 취약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독일이 경제력으로 얼마든지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독일 내부의 여론과 합의인데, 이것이 쉽지 않다. 독일이 유럽연합에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면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독일의 재무장이라는 금기를 깨는 것에 대해 외부적 시각에서의 우려의 시선이 많다. 독일 총리에 관한 낮은 지지율도 독일의 실질적 재무장을 완료하기까지 이겨내야 할 난관이 많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데 독일의 재무장 카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리면서 정치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미국이 독일의 족쇄를 풀어주는 대가로 독일에게 유럽의 방위를 실질적으로 맡기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독일은 미국에게 재무장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독일의 재무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독일의 재무장은 핵무기와 관련해서 자칫 러시아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통해 전술핵을 핵무기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고 튀르키예에 배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해서 그 통제권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미국이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이 프로그램을 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폐기될 것인지가 논란이 될 것이다. 독일이 재무장을 할 경우에도 핵무장이 포함될 가능성은 아마도 낮을 것이다. 그 때문에 독일은 이 문제에 관한 한 프랑스에 협조를 구할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독일의 재무장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일이 원하는 방식을 프랑스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많은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로 유럽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프랑스가 차후 이 문제에 관한 한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이슈가 될 것이다. 독일의 재무장은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를 자극해서 오히려 유럽의 안보 전체가 위험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역설이다. 독일이 러시아의 위협을 명분으로 재무장을 할 경우에, 물론 러시아의 위협에 맞설 국가가 독일 외에 없을 것이겠지만, 오히려 러시아와 협상을 하는 국가들도 출현하게 될 것이다. 특히 동유럽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유럽이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평화를 유지하면서 전쟁의 위협을 줄이고, 국제분쟁에서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이든 프랑스든 러시아를 적절하게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유럽은 현실적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스스로 걷어 차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의 재무장 문제는 단지 최근의 일만은 아니었다. 독일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해 왔다. 거기에는 독일도 이제 전범국이라는 오명을 걷어내고, 유럽의 평화에 앞장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독일이 충분히 피해국들에게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 독일의 재무장은 미국이 유럽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국 포위망을 실행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유럽에서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긴 하지만, 문제는 유럽이 스스로 복잡한 역학관계에 노출이 되어있는 유럽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상군에 취약한 유럽이 미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유럽을 이끌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단일대오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서로의 경제적 편차가 너무 크고, 군비에서 방위분담금의 목표치를 얼마나 도달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의 재무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군비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은 그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은 유럽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으며, 이것은 유럽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렇게 되면 유럽연합이 흔들리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너무나 뻔하다. 유럽은 이제라도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성격을 띠는 전쟁을 속히 종식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재무장보다는 오히려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독일의 재무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독일의 재무장이 러시아의 위협에 근거한 것이니까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실로 그럴듯한 명분일 수 있다. 이 속에는 다른 의도도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또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합리적 의심은 무엇보다도 피해국의 입장에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독일의 재무장 선언은 정치적일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독일의 재무장 카드는 다른 한편으로 유럽 전체와의 관계설정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분명히 유럽이 독자적인 목소리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것은 독일의 재무장이 승인되더라도 독일이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물론 세부적 사항은 이 경우에도 논의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위상도 바꾸어야 한다.
-
- 칼럼
- Nova Topos
-
독일의 재무장, 독배가 될 수 있는 이유
-
-
특색있는 루마니아 사람들과 문화
- 루마니아 인종들은 민족성 자체가 밝다. 그리고 매우 긍정적이고 성격은 다혈질이며 루마니아 인들은 전반적으로 노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루마니아의 어디를 가든 가무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루마니아는 음주가무의 천국인데 전통적인 결혼식에서그 진면목을 볼 수 있다. 루마니아의 전통은 가수나 악단을 불러 밤새도록 춤추고 먹고 마시는 것이 보통이며,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는 악단이 집집마다 연주하며 다니고 있다. 기본적으로 음악이 나오면 언제 어디서든지 춤을 출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루마니아 특유의 국민성이다. 어찌나 춤을 많이 추는지 장거리 고속버스 안에서도 관광버스처럼 춤추고 노는 것도 일상인 사람들이다. 루마니아는 국민 종교인 정교에 대한 종교심은 깊은 편이지만 러시아 정교회와는 달리 아주 세속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적으로 서유럽이나 북미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술과 할로윈 파티 귀신분장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제법 많은 것에 비하면 정반대 현상인 것이다. 당장 국민 1인당 술 소비량 부터가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들어가며, 마녀가 직업으로도 인정된다. 우선 드라큘라부터가 사실상 루마니아를 대표하는 국민 귀신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루마니아는 유럽에서 컬러 TV의 도입이 가장 늦었던 나라이기도 하다. 루마니아의 국영방송안 텔레비지우네아 로므나(Televiziunea Română)의 TV방송 시작은 1956년에 했다. 이는 동유럽에서 TV 송출이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그러나 컬러 방송은 북한보다도 10년이나 늦은 1983년부터 송출되었다. 그마저도 컬러 방송이 완전히 정착한 것은 루마니아가 민주화 된 이후부터이다. 1990년도 이후에서야 컬러 방송이 가능했다는 것인데 그 이전에는 모두 흑백방송으로 채워진다. 1989년 루마니아 혁명 당시의 컬러 중계는 모두 외국이나 서유럽에서 송출된 것이고 루마니아 국영으로 방송된 것들은 모두 흑백이라 보면 된다. 물론 차우셰스쿠 시대에는 차우셰스쿠에 대한 선전 방송이 위주였고 그나마 1980년대에는 에너지를 절약한다며 방송시간을 평일 2시간, 주말 3시간으로 줄였다. 그리고 TV 채널도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이면서 사실상의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외국 프로그램도 상당량 수입하였는데 특히 달라스나 디즈니에서 제작한 만화 같은 미국 TV프로그램도 편성했었다고 전해진다. 어쨌든 반소감정이 있고 친중 및 친북을 했던 국가였기에 생각보다 소련의 방송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루마니아에는 북한의 채널들을 많이 수입했었다고 한다. 필자의 루마니아 지인들의 당시 회상을 듣다보면 북한 김일성의 교시도 그대로 송출이 되어 자신들도 어이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 정도로 차우셰스쿠는 김일성을 좋아하고 그의 정책 모델을 상당수 따온 인물로 유명하다. 그리고 루마니아 TVR이 BBC와 제휴를 맺으면서 TV 프로그램 제작 노하우를 전수받을 정도로 제법 선진적인 방송을 도입했었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 침체가 이어지자 이 방송들조차도 거의 방영이 되지 않는 사례도 허다했다. 당시 경제 사정이 악화일로였던 북한조차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TV 채널을 줄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루마니아 국민들은 자국 TV 채널을 버리고 이웃인 유고슬라비아와 불가리아, 그리고 소련, 헝가리의 TV 방송을 몰래 시청했고, 불가리아 TV 편성 정보도 암시장에서 암암리에 돌아다녔다. 그리고 불가리아의 TV 만화와 불가리아 영화도 이 시기 루마니아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으며 불가리아의 당시 연예인들은 루마니아에서도 제법 인기를 끌었었다고 전해진다. 루마니아가 민주화 된 이후에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같이 국영방송을 공영방송으로 전환하고 광고방송도 개시했다. 루마니아는 소련에서도 하던 광고방송을 그동안 하지 않았었는데 유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광고, CF 방송을 한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방송시간도 다시 확대했으며, 민영방송을 허용하면서 급격히 상업화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방송에 대해 잘 모르는 인사들이 많아 낙하산 문제라든가 정치 언론의 유착 문제 등이 대두되기도 하였지만 차우셰스쿠 때보다는 매우 재미있어지고 다채로워진 것만큼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루마니아의 방송 환경은 대만과도 비슷한데 시청률 10%를 넘는 채널이 없다는 점이 문제였고 자국의 지상파 채널은 시청률이 더 낮아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존폐성이 부각되었다. 그래서 미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인도 드라마, 터키 드라마, 텔레노벨라 등 다양한 외국 드라마들이 수입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 드라마도 많이 방영되었고 K-POP도 흥행을 타면서 루마니아의 지상파 시청률은 다시 올라가 현재는 시청률이 다른 케이블 방송 못지 않을 정도이다. 또한 루마니아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이다. 헌법상의 결혼 개념을 '배우자 간 결합' 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바꾸는 것을 놓고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가 2018년 10월 6일과 7일에 실시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개헌을 통해 동성 결혼의 허용을 막으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개헌 지지파로는 보수성향의 비정부 기구인 '가족 연대' 와 루마니아 정교회 등이 대표적으로 신부들은 신도들에게 예배 후 투표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루마니아에서 동성결혼은 현재도 불법이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헌법상 결혼이 '배우자 간 결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기에 이를 방지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미리 결혼 개념을 '남녀간 결합'으로 못박아 놓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최소 30%를 넘어야 하는데 결국 투표율이 5.72%로 저조해 자연히 무산되었다. 당시 루마니아 인들에게 있어 남녀 간의 결혼이나 결합은 당연한데 굳이 이런 것까지 개헌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라 투표율이 턱없이 낮았다고 전해진다. 루마니아의 문화에 의하면 루마니아는 2월, 3월, 7월, 8월, 9월, 10월에는 공휴일이 전혀 없으며 대체휴일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2021년과 같이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면 12월 1일 국경절 이후 1월 24일 통일의 날까지 평일인 공휴일이 없게 되는데 이는 루마니아 인들은 열심히 직장과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빚어진 차우셰스쿠의 노동 정책의 반영 때문이다. 루마니아 인들의 정서상 일하고 가족에게 충실해야 하다는 것은 당연한 문화라고 보기에 이 공휴일 많지 않은 노동 정책은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동유럽에서 가장 공휴일이 적은 나라가 루마니아이기도 하다. 그러나 거룩하게 쉬어야 하는 일요일은 가족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가는데 소금 광산을 개조한 살리나 투르다(Salina Turda)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 놀이공원으로 무려 지하 120m에 달한다. 매 일요일마다 살리나 투르다 같은 놀이 공원은 수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다.
-
- 칼럼
- Nova Topos
-
특색있는 루마니아 사람들과 문화
-
-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바라보는 몰도바의 입장
- 몰도바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두 나라 간의 드니스트르 강을 중심으로 상호교류는 매우 활발하다. 2017년 1월 4일에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제2의 도시 벤데르에서 이고르 도돈 몰도바 대통령과 바딤 크라스노셀스키 트란스니스트리아 대통령이 양측 역사상 최초의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자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8년에 벌어진 유엔 총회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에 파견된 모든 외국군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친 서방 성향의 몰도바 정부가 주도하여 조지아, 발트 3국, 우크라이나, 캐나다 등이 함께 마련한 결의 안에 대해 찬반 표결을 벌였고 투표에 참여한 162개국 가운데 64개국이 찬성표, 1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83개국은 기권함으로써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옛 소련 국가인 벨라루스와 아르메니아 등이고 러시아에 우호적인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이었다. 이에 러시아 외무부는 트란스니스트리아로부터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철수하도록 규정한 유엔 총회 결의는 이 지역 분쟁 해결에 대해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몰도바가 제안한 결의 안은 아주 증오스럽고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몰도바 지도부에서도 유엔 총회 결의에 대해 통일된 견해가 없다면서 러시아는 이 결의를 반러 정서에 기대하여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으려는 몰도바 내 특정 정치 세력의 명백한 선동주의적 행보로 간주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배경에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있다며 미국과 서구권도 한데 몰아 비난했다. 친러시아 성향의 이고르 도돈 몰도바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몰도바 총리 측이 유엔 표결을 주도했다. 그러면서 다른 반러 행보를 취했다면서 집권 연정은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흔들린 국내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무대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16년 11월 결선 투표 끝에 대통령에 선출된 친러시아주의자 도돈은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는 파벨 필립 총리 내각과 줄곧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파벨 필립 총리의 음모라고 비난했다. 총리가 이와 같은 독단적인 행위가 가능한 것은 내각책임제를 통치 체제의 근간으로 채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총리가 운영하고 대통령은 제한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과 함께 지난 2014년 6월, 파벨 필립 총리 정권이 EU와 FTA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유럽화 노선을 걷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주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2008년 조지아로부터 분리 및 독립을 선포한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두 나라밖에 없으며 이 두 나라의 독립도 러시아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는 1992년 몰도바와 맺은 협정에 따라 트란스니스트리아에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수천 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이 고작 수 천명의 군대가 몰도바와 유럽에서는 위협이 된다고 철수를 촉구하는 것이다. 한편 트란스니스트리아 독립 정부도 러시아군 철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서구와 몰도바 총리 정부의 결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서방 몰도바 총리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의 결의를 근거로 러시아군 철수 조치를 강행시키려 할 경우 트란스니스트리아 내 러시아인들이 반발하면서 2014년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병합된 것과 유사한 '제2의 크림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결국은 이와 같은 결정이 취소되었지만 몰도바-트란스니스트리아 사태는 우크라이나-돈바스 사태 못지 않은 또 다른 동유럽의 새로운 화약고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2018년 9월 1일 중립 지역에 대한 차량 번호판이 도입이 러시아의 주도로 유엔에서 주최되어 가결되었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트란스니스트리아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은 몰도바를 포함한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없었다. 그래서 2015년 몰도바의 차량 번호판 체계를 따르면서 글꼴이 다르고 몰도바 국가 표식이 없는 대신 "MD" 스티커로 몰도바 차량임을 표시하는 새로운 번호판이 도입되었다. 해당 번호판은 트란스니스트리아 외부에서는 몰도바의 차량으로 취급받으며, 2021년 9월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중립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은 트란스니스트리아 차량의 입국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트란스니스트리아 입장에서는 몰도바의 MD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중립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 정부를 달래면서 러시아와 연결될 수 있는 조치였음을 상기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돈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친서방 성향의 마이아 산두가 당선되면서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두 대통령은 당선 직후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와 다른 나라임을 천명하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몰도바에서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일부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이 투표에 참여하는 광경이 벌어지곤 한다. 몰도바 입장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국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막지 않고 있다. 다만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들은 친서방 몰도바 인사가 아닌 친러 몰도바를 인사를 찍으며 자신들의 현 상황을 우선 유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친러 성향의 몰도바 후보자들은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방문해 유세하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미승인국이면서 내륙국이기 때문에 소련 해체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지역이기도 하다. 몰도바의 1인당 GDP가 유럽 최하로 나오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열악한 경제 사정 때문인 것도 있다. 소련시절에는 발전된 공업 지대였지만 분리독립 선언 이후로 내륙국인데다가 미승인국이라는 불리함까지 겹쳐서 낙후되어 버린 것이다. 러시아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에 경제적인 지원을 보내주고는 있지만 미승인국이라 대규모 지원을 보내주기에도 외교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 게다가 러시아 본토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으며 공장을 건설한다 해도 수출을 하거나 러시아로 물자를 공급하려면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거쳐야 되다 보니 그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들의 사실상 주 소득원은 러시아 등으로 가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고 러시아 루블을 자국에 송금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외화벌이가 국가의 주 수입원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2022년 몰도바가 EU 가입을 선언하게 되면서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독립을 선언했다. 독립 선언은 이미 소련과 분리된 이후에 했지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특수 군사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벌어진 사건이고 러시아의 위협이 가속화 된다 생각한 몰도바에서 EU 가입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러시아에 적극 협력하겠다 밝혔고 자국에 러시아군 1,500명이 주둔한 상태라 이들이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변수가 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몰도바의 군대는 예비군까지 합쳐 8만 명도 되지 않아 러시아군 1,500명의 숫자가 매우 위협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자, 우크라이나 측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로 가는 물류를 끊어 버리게 되면서 트란스니스트리아는 고립되었다. 그래서 몰도바에게 인도적인 물자 원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까지 왔다. 러시아도 오데사와 미콜라이프도 아직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상황이라, 몰도바는 이와 때를 같이하여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완전히 멸망 혹은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 않다. 러시아 군이 수송기로 물자를 실어날라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지원하면서 몰도바에 대한 경제 원조를 하지 않게 되었으며 러시아의 수송기가 자주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왕래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체계가 붕괴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5월 9일, 러시아 전승기념일에도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수도 티라스폴에서는 군사 퍼레이드가 개최되어 나치 독일의 축출을 기념했다.
-
- 칼럼
- Nova Topos
-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바라보는 몰도바의 입장
-
-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 됐지만 북한의 국가체계를 세워준 고려인들과 중앙아시아의 유지로 자리 잡은 고려인들
- 대조국 전쟁이 끝나자 한반도 북부에 진주한 소련군은 그곳의 조선인들과 함께 새 국가 건설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곳의 조선인들은 국가 건설은커녕 행정 경험도 거의 없었다. 그렇다고 일제 부역자들에게 의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소련 정부는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일부 고려인들에게 조선의 국가 건설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구역 당ㆍ공산주의청년동맹ㆍ콜호즈(집단농장)ㆍ기업체ㆍ교육기관ㆍ군 등에서 일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이들이었다. 1945년부터 49년까지 약 500명의 고려인들이 북한으로 파견되었다. 이들은 조선 출신으로 스탈린 체제 하에서 민족적 억압을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공민이었다. 북한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이들은 자신이 ‘파견’된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귀향’한다고 생각했을까? 북한에 파견된 고려인들은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소련에서 포시에트 구역 공산청년동맹(콤소몰) 비서로 일한 바 있는 허가이는 1946년 조직된 조선공산당 북조선조직위원회의 규약과 조직 체계를 마련하고, 당 중앙위원회 제1 비서와 부위원장에까지 오른 조선로동당의 산파였다. 사마르칸트에서 고중학교 교장을 지낸 기석복은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의 주필로 일하며 선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마찬가지로 타슈겐트에서 고중학교 교장을 지낸 유성훈은 내각 간부학교 교장과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을 역임하였다. 옴스크의 고리키사범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조기천은 1947년 서사시 <백두산>을 발표하며 북한을 대표하는 문인이 되었다. 소련 중앙은행 산하 재정대학을 졸업하고 동 은행 포시에트 지부장을 지낸 김찬은 조선중앙은행 총재로 일하면서 1947년 화폐개혁을 주도했다. 로스토프의 운수대학에서 철도운수를 전공한 박의완은 1948년 초대 내각의 교통상이 되었다. 이르쿠츠크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근무한 리동화는 조선인민군 군의국장을 맡아 한국전쟁 시기 야전병원에서 동분서주하였다. 한국전쟁 때 북측 대표로 휴전회담에 참석한 남일 또한 잘 알려진 파북 고려인 중 한 사람이다. 콜호즈에서 다른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1946~1950년 시기에는 1헥타르당 4~5톤에 이르는 쌀을 생산해 내었고, 일부 작업반들은 심지어 8톤까지도 생산하면서 농업적 성과와 김병화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 소련 당국이 1948년에 처음으로 노동영웅 칭호가 수여되었다. 이후 1951년에는 콜호즈 건설과 목화 및 벼 수확고의 성과에 따른 결과로 다시 레닌훈장과 ‘낫과 망치’ 금메달을 받았다. 이곳 콜호즈는 강제이주라는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시대를 앞서갔던 고려인 동포사회의 희망이셨다. 소련 당시 고려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즈베키스탄 콜호즈(집단농장)은 20개에 달했는데 한결같이 우즈베키스탄인들에게 ‘백만장자’ 콜호즈로 불리우며 부러움 샀다고 한다. 1950년대 초만 해도 우즈베키스탄에는 도시지역에도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이 거의 없었지만 고려인들이 운영하는 콜호즈들은 자체 발전소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해내어 콜호즈 전체에 가로등까지 설치해서 우즈베키스탄 인들이 단체 견학을 올 정도로 발전되었다. 흐루시초프 소련 서기장이 김병화 선생에게 3번째로 노동영웅을 수여하라고 지시하였다. 하지만 선생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이 3번에 거쳐서 노동영웅을 수여받기보다는 우즈베키스탄사람이 상을 수여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사양한 적이 있다. 이것은 선생의 겸손과 고려인 동포, 우즈베키스탄인 사이의 화합과 단합을 위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959년에 당시 베트남 호치민 주석이 소련 방문 시에 우즈베키스탄의 김병화 선생의 콜호즈를 방문하였다. 뿐만 아니라 흐루시초프, 브레즈네프 서기장 등 소련의 정치지도자와 사회주의권의 다른 지도자들도 자주 농장을 방문하여 선생과 고려인 농장원들의 놀라운 성과를 살펴보는 일정을 가지곤 했다.
-
- 칼럼
- Nova Topos
-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 됐지만 북한의 국가체계를 세워준 고려인들과 중앙아시아의 유지로 자리 잡은 고려인들